“지난 10년간 일본이 변한 게 느껴지십니까?”
심층 취재와 경제 지표로 들여다본 일본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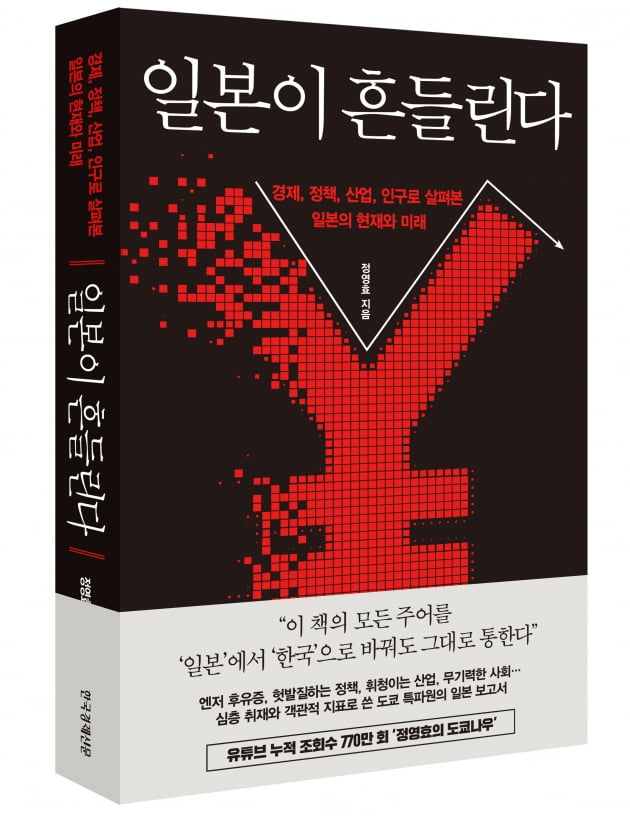
‘일본의 현재가 곧 한국의 미래다.’ ‘일본을 배워야 한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얘기다. 관련 내용의 책도 부지기수다. 하나의 장르라고 해도 될 정도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일본은 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사회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지금 일본은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 책이 한국이 일본화되는 것을 막는 백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저자의 말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어쩌다 ‘일본 위기론’까지 나오게 된 것일까.
‘일본이 흔들린다’는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쇠락의 신호들을 경제·정책·산업·인구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다. 구조 조정, 산업 체질 개선, 낡은 규제 폐지 등을 회피해 왔고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기술 혁신 시기를 놓친 결과 국가 전반이 휘청거리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경제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안전 자산으로 믿고 있던 엔화 불패의 신화도 흔들린다는 분석도 들려준다.
저자 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2020년 3월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2016~2017년에도 방문 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무른 적이 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본을 찾았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에서 나타난 변화를 전하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카더라’가 아닌 정부 통계, 전문 보고서, 관계자·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썼다. 한 문장, 한 문단 안에도 팩트로 가득하다. 한국과의 비교·대조도 꼼꼼하다.
이 책은 네 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 행정 구조의 약점이 노출되며 ‘눈 깜짝할 사이 후진국’이 된 상황을 다양한 통계와 소비 시장의 변화 등으로 설명한다. 2장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규모의 ‘코로나19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느린 회복 속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전자 정부’를 구상하고도 팩스와 플로피 디스크로 업무를 보는 관공서 등 일본 정부와 행정 서비스의 패착을 짚었다. 3장은 1990년대까지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추적했고 4장은 일본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는 것이 한 나라를 어떻게 시름시름 앓게 하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록했다.
“이 책에서 다룬 모든 문장의 주어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도 그대로 통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지방 소멸 등을 다룬 4장은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한국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두 가지 통계를 보자.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데 25년이 걸렸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6년 초고령 사회가 됐다. 35년이 걸린 것이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한다. 다음은 출산율이다.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다. 일본은 어떨까. 2021년 기준 1.30명이었다. 저자 역시 “초저출산국 일본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사정이 훨씬 낫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험난한 미래에 함께 대처할 수는 없을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어 한·일 양국이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덜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일 모델을 만들어 환경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쟁,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면서 강한 제조업 역량을 유지하는 경쟁,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경쟁 등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도 들려준다. 이를 통해 한·일 원팀이 당장 미국과 중국 수준의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김종오 한경BP 출판편집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