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고사가 코앞에 다가온 A군.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느낌에 서둘러 책이며 필기노트를 펴보지만, 양이 너무 많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틀린 것 같아’,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돼’ A군은 고민에 빠진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한다. 그리고는 포털사이트에 ‘커닝’을 검색한다.

조선시대부터 커닝은 시작됐다
커닝의 역사는 시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다. 3년에 한 번 있는 과거를 통해, 국가의 정식관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33명. 가문의 흥망이 단 한 번의 시험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담감 가득한 시험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틈만 나면 커닝을 시도했다.
숙종(숙종실록 31년 2월 18일) 때는 대나무 통을 이용한 기발한 커닝 방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나무 통을 땅에 매설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지를 건네고 답안지를 건네받는 방식이었다.
조선 후기때는 커닝이 더 많아졌다. 대리시험, 훔쳐보기는 예사이고, 당당히 책을 들고 고사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고전적 수법의 60년대, 2016년 커닝은 더욱 더 대범해져
경향신문 63년 6월 27일자 ‘커닝의 진단’이라는 기사는 대학가의 커닝을 다룬다. 대리시험, 훔쳐보기, 커닝페이퍼 등의 고전적인 수법들이 당시에도 널리 쓰였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커닝을 해 봤냐’고 물었을 때,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동아일보 95년 4월 18일자 ‘횡설수설’란에는 재미있는 통계가 실려 있다. 한 여자 대학교에서 9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 45%가 커닝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57%는 놀랍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90년대 후반, 부정행위는 더 빈번히 일어난다. 한겨레 99년 6월 15일자 ‘사회진보 막는 부정’이라는 칼럼은 외국인 교수의 시선으로 한국의 커닝을 바라본다. 외국인 교수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커닝을 저지르는 학생이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교수들의 태도를 지적한다.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커닝을 한다. 2013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이 커닝으로 적발됐다. 이 학생은 교수의 컴퓨터에서 몰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2015년 서울대는 시험 부정행위로 홍역을 앓았다. 부정행위는 철학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성의 철학과 성윤리’ 중간고사 시간에 일어났다. 학생들은 서로 답안을 공유하고, 휴대폰을 보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16년 1월 전북대 공과대학 학생회 6명도 커닝으로 적발됐다. 유출된 시험지의 답을 공유한 혐의다.
글 조근완(국민대) 대학생 기자 ktm129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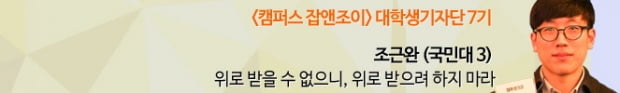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