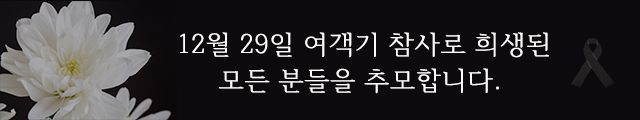최두영 SPOTV 스포츠캐스터
![[이색직업 탐방 ② 인터뷰] “경기장 속에 녹아들어야 진솔한 멘트 나오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D.25666191.1.jpg)
강원대 정치외교·신문방송 전공
2011년 MBC스포츠플러스
2012년 spoTV 입사
스포츠캐스터의 깔끔한 멘트는 경기를 이해하는 데 십분 도움이 된다. 또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응원 열기는 어디가 뜨거운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스포츠캐스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선수들의 숨소리, 감독의 작전 지시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자 애를 쓰는 최두영 캐스터로부터 ‘LIVE’한 얘기를 들었다.
스포츠캐스터를 천직으로 여긴다고요?
원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아나운서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스포츠 중계를 하는 회사에 시험을 볼 기회가 생겼고, 경험 삼아 해보려고 응시를 했는데 합격했어요. 무척 재미있었죠. 막상 해보니 ‘이 분야를 앞으로 내 활동 무대로 삼아도 후회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스포츠를 언제부터 좋아했나요?
강릉이 고향인데 그 지역엔 유명한 고등학교 축구 더비(derby)가 있어요. 강릉농고와 강릉상고 간의 경기죠. 지금은 각각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더비는 강릉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빅매치예요. 저는 이 더비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스포츠 그리고 응원 문화에 대한 호감과 환상이 있었어요. 오히려 스포츠에 대해 관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요. 또 대학 재학 시절 제 자취방에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걸 좋아했는데, 같이 모여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등을 보는 게 재밌었어요. 한 번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같이 보다가 골이 터진 대목에서 제가 “세 개의 왼발이 만들어낸 골이다”라고 외쳤는데, 당시 중계하던 캐스터도 똑같은 멘트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었어요.
스포츠캐스터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혹자는 학원을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학원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보다는 혼자서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듯해요. 저는 6개의 스터디에 참여하며 준비를 했는데, 학원은 스터디하며 느낀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활용했어요.
스포츠캐스터의 일과가 궁금해요.
프로농구 중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점심때쯤 출근을 해서 PD들과 그날 경기에 대한 회의를 해요. 중계 방향, 관련 자료 조사 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경기 시작 시간 세 시간 전에는 경기장에 도착해요. 중계 스태프들과 인사도 하고, 현장에 녹아들기 위해서 미리 중계석에 앉아 보죠. 관중석도 둘러보고 구단 직원들과도 만나고요.
중계를 하다 해설위원이 기절을 했던 적이 있다고요?
핸드볼 중계를 했을 때예요. 전반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팔이 골절됐는데 부상 정도가 심각했죠. 그걸 앞에서 지켜본 여성 해설위원이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해설위원의 건강이 염려됐지만, 후반전 중계도 막막해졌죠. 다행히 그날 경기를 보러왔던 임오경 감독이 마이크를 맡아줘 무사히 중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스포츠캐스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때 젯밥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포츠캐스터를 계기로 인기를 얻고,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이요. 그런 의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단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일을 간절히 원하는 다른 그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스포츠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캐스터가 왜 안 될까’라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캐스터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해요.
어떤 캐스터로 성장하고 싶나요?
어떤 중계를 맡겨도 잘 해내는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세팍타크로 같은 생전 안 해본 종목이 있을 때, ‘최두영에게 맡기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거요. 또 제 중계를 보고 스포츠팬이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운 팬이 되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글 박상훈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