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달그믐날 고마움 전해, 이제는 ‘까치 설날’ 동요로만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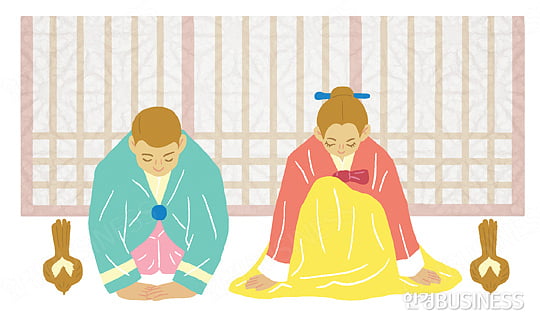
설날이 다가오면 필자는 이상하게 묵은세배가 먼저 생각난다. 아주 어렸을 때 섣달그믐, 내일이면 설날이라 들떠있는데 편찮으셨던 아버지는 동네의 어떤 집에 세배를 다녀오라셨다. 뜬금없이 세배라니. 툴툴대며 나가려는데 봉투를 주시며 세뱃돈으로 전하라니 어린 마음에 좀 황당했다. 그게 내 유일한 섣달그믐날 세배였다. 그걸 묵은세배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다.
묵은세배는 섣달그믐날 저녁에 그해를 보내는 인사로 웃어른에게 하는 절을 뜻한다. 예전에는 섣달그믐을 작은설이라고 해서 설과 같이 어른이나 조상신에게 세배를 올려 과세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섣달그믐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끝맺음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조상과 부모, 이웃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풍속을 따랐다.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속이니 요즘으로 치자면 그게 바로 송년회일 것이다.
옛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묵은세배에 관한 것이 많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조정에 나가는 신하로서 2품 이상과 시종(侍從)들은 대궐에 들어가 묵은해 문안을 드린다. 양반들의 집에서는 사당에 배알한다. 연소자들은 친척 어른들을 두루 방문한다. 이러한 것들을 배구세(拜舊歲:묵은세배)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 홍석모(洪錫謨)는 “묵은세배를 하느라고 이날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초롱불을 든 세배꾼들이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다”고 기록했다.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 제석조(除夕條)에도 “섣달그믐날 만나고 맞이하며 또한 절하고 물러가니, 바쁘기가 홀연히 멀리 떠날 때와 같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 예전에는 섣달그믐날이 되면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 문안 인사하던 풍속이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정 강요되면서 송년회에 자리 내줘
묵은세배의 풍속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경북 지방에서는 그것을 ‘과세 지낸다’고 불렀다고 하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다. 섣달그믐날 가족이나 친척끼리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는데 그해 환갑이 되는 사람은 다른 마을에 있다가 그믐날 밤을 지내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집에 돌아온다는 점이다. 만일 다른 마을에 갈 형편이 못 되면 닭이 울기 전까지 변소에 앉아 있다가 돌아왔다. 그것은 옛날부터 환갑 맞은 노인은 그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해서 액막이의 방편으로 임시로 피한 것이었다. 과세 지내는 풍습은 세배하지 않아도 서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감사의 정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묵은세배로 절을 올리건 올리지 않건, 형식과 절차가 같건 다르건 묵은세배의 의미는 모두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섣달그믐에 묵은세배를 보기란 이제는 어렵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거추장스럽다는 핑계로 건너뛰다가 이젠 아예 그런 낱말조차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일제 이후 강요된 신정 과세로 묵은세배는 송년회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풍이 엄한 집에서는 사당에 모여 구세배니 그믐세배를 했다지만 대개는 그저 동네 어른을 찾아다니며 간단하게 세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모두가 정신없이 살면서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사실 ‘까치설날’이 바로 묵은세배하는 설날이라는 뜻이다. 까치설날에 아이들은 새로 지은 꼬까옷을 입었으니 제법 신도 났을 것이다. 이제는 풍요로워 설이나 추석이라고 따로 옷을 사 입을 일 없으니 그저 ‘까치 까치 설날은’이라는 동요로만 남았다. 그나마도 그게 무슨 날인지조차도 모른 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잃어버린 걸까
아이들에게 까치설날, 즉 섣달그믐은 설빔(요즘은 아예 이런 낱말조차 무의미해졌지만)을 처음 입을 수 있는 날이어서, 그리고 미리 장만하는 설음식을 미리 슬쩍 맛보는 풍요로움 때문에 즐겁기는 했다. 그래서 섣달그믐이면 아이들은 제 옷을 자랑하고 싶어 동네를 휘젓고 어른들은 혹여 설날 입을 옷 더럽혀 올까봐 미리 한 번 입혔다가 얼른 벗기느라 실랑이도 벌였다. 그러나 필자의 기억으로는 어린 마음에 묵은세배는 매력이 없었다. 세뱃돈이 없었으니까…. 필자가 기억하는 묵은세배는 무슨 공적 행사 같다는 느낌뿐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앞세우고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묵은세배를 하면서 따로 봉투를 마련하셨다. 신기한 것은 분명 절을 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으니 그게 싫었다. 그런데 어느 해였을까, 필자만 혼자 그 일을 했다. 그해 섣달그믐에는 편찮으셔서 필자에게 심부름 겸 묵은세배를 시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왜 우리에겐 주지 않으면서 남에겐 줄까 하는 마음에 야속하고 못내 아쉬웠다. 물론 다음 날 우리가 받는 세뱃돈으로 상쇄되긴 했지만….
묵은세배 때 아버지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다녔던 까닭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 필자가 당신의 나이와 겹칠 때쯤이었다. 묵은세배는 지난 한 해 덕분에 잘 지냈다며 인사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라며 인사하고 덕담을 드리는 것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외려 명절이 자칫 서러울 이들의 살림을 살피고 슬쩍 촌지를 건네는 기회이기도 했다. 요즘으로 치면 그게 불우이웃 돕기인 셈이었다. 그런 배려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멀리서 찾아온 자식들이 섣달그믐에 고향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묵은세배와 함께 형편에 맞게 마련한 돈을 드리면 그게 다음날 손자손녀들의 세뱃돈이 됐다.
묵은세배는 지나온 한 해를 아쉬워하기보다 함께 살아온 한 해에 대해 감사하며 나누는 인사라는 점에서 정겹다. 하지만 진짜 살펴야 할 그 풍속의 의미와 가치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의 살림살이에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덜어주는 사랑이다. 묵은세배를 잊고 살면서 그런 눈길과 마음까지 작별하고 살아온 것 같아 아쉽고 부끄럽다. 묵은세배가 지녔던 조용한 배려의 마음이 그립다.
묵은세배는 잊혔다. 하지만 그 뜻이 깊고 좋으니 다시 살려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섣달그믐 여기저기 묵은세배 다니는 모습을 다시 살려 내자. 그런데 요즘 생활 방식에서 그날 찾아갈 집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꼭 옆집이나 같은 단지 아파트 주민 아니어도 좋을 일이다. 그 범위를 넓혀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은세배를 하러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해고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해 시린 겨울 지내야 하는 이들,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체념의 동굴로 자신을 유배시킨 노숙인들, 난방비 아까워 차가운 방에서 홀로 야윈 몸 웅크린 외로운 노인들, 취업하지 못한 청춘들, 돌봐줄 이 없어 외려 방학이 서러운 배고픈 아이들…. 그들에게 묵은세배를 다니며 마음을 나눈 뒤에야 설날 조상께 인사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덕담하고 세뱃돈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자기 살기 바쁘다고 남 살필 줄 모르고 자기 잘되자고 남 짓밟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
동네의 어려운 이가 명절에 외려 더 마음 아픈 걸 외면하고 자기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옛 어른들은 묵은세배를 통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다. 묵은세배를 잊으면서 우리가 잃고 산 것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뤄지는 것은 죄악이지만 남의 불행을 외면하는 자신의 행복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묵은세배를 통해 조금은 덜 부끄러울 수 있으면 좋겠다. 설날을 제대로 맞아 새로운 한 해의 행복을 빌고 싶다면 함께 기쁘게 살아갈 마음가짐부터 다져야겠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