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명동·강남역 등에서 ‘억’ 소리 듣는 건 일도 아니다.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미친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미친 임대료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빅 브랜드’는 손익계산서와 상관없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요지에 입점한다. 기업이 끌어올린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 A급 상권에서 쫓겨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다. 기업들끼리도 뜨는 업종이 지는 업종을 쫓아내는 형국이다.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임대료·권리금 문제를 풀 실마리는 없는 걸까.

국내 최고 상권인 명동 중앙로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명동길로 이어지는 곳으로 H&M·자라(Zara)·유니클로(Uniclo)·미쏘 등의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매장의 격전장이다. 지난해 유니클로 매장에 이어 올해 미쏘가 가세하면서 상권 경쟁은 거의 마무리된 분위기다. 이런 손 바뀜으로 인해 이곳 임대료는 월 2억~3억 원까지 올랐다.
임대료가 오르는 이유는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는 저가 의류 후발 브랜드가 입점하려고 무리수를 쓴 것이 원인이다.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명동을 떠나면 그만한 상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테니, 새로 들어오려는 브랜드는 임대료를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 화장품과 저가 의류 매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과 패스트푸드 매장이 자리를 내줘야 했다.
‘억’ 소리 나는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후발 주자들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명동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명동에 매장 하나 없는 패스트 패션은 별 볼 일 없는 브랜드’라는 오명을 쓰기 싫어서다. 또 명동에 매장을 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자연스레 홍보가 된다. 그러다 보니 비싼 임대료는 ‘이익’ 차원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지불하게 된다. 홍보비를 쓸 필요가 있는 브랜드는 명동에 입점하고 쓸 필요가 없는 브랜드는 명동을 떠나야 한다. 이런 현상은 명동뿐만 아니라 강남역도 마찬가지다.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밀려난 브랜드가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친 임대료’가 타 상권으로 전파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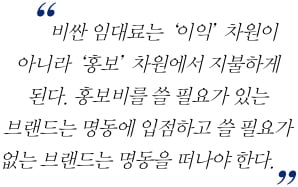
한국의 독특한 권리금 관행도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영업이 안 되면 빨리 털고 나와야 하는데, 권리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 영업이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은 없다. 권리금을 낮춰 빨리 넘기든지,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장사를 하든지 어느 쪽이든 자영업자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다. 가게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이 중앙 버스 차로로 옮기면서 하루아침에 권리금이 날아간 경우도 있다. 어쨌든 권리금은 돌려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할 듯하다.
특급 상권은 미친 듯이 임대료가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광장시장·경동시장 등의 재래시장은 수년째 임대료가 제자리다. 명동이라고 해도 저가 의류와 저가 화장품이 차지한 요지 외의 소점포 골목은 월 임대료가 400만 원(66㎡ 규모 1층 평균) 이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다.
취재=우종국·이현주 기자·박형영 객원기자
전문가 기고=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사진=서범세·김기남 기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