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법알못 판례 읽기]
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은 사례였다.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임야에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2년여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추운 날씨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일단락됐다.
‘기존 질환’ 두고 엎치락뒤치락…엇갈린 하급심
사건은 A 씨가 B 조합과 공공 근로 사업 일용직 근로 계약을 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4년까지 약 30여 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공공 근로 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B 조합과 2017년 3월 7~10일까지 ‘수목 제거 사업’에서 일하고 11~21일까지 열흘간 ‘나무 주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무 모두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가 이뤄졌다.
수목 제거 사업은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뒤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이후 A 씨는 11일 계약대로 두 번째 공공 근로 사업에 투입됐다. A 씨가 담당한 일은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이용해 소나무 낮은 곳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과 약제 주입 작업이었다.
A 씨는 이날 산지에서 약 9kg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메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근무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A 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A 씨가 쓰러진 날 철원의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4.9도였다.
유족 측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 씨의 지병이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과거 고혈압·당뇨·협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 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아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는 평소 철저한 건강 관리로 지병을 관리해 왔다”며 “추운 날씨에 예초기 엔진을 메고 경사진 비탈길을 이동하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2016년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기존 질환들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전 공공 근로 사업 당시 4일간 꽃샘추위가 있었던 상황이고 나무 주사 사업 역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상 재해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2심에서 곧바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고 A 씨의 급격한 신체 활동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공공 근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의 강도가 과중했거나 A 씨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 씨가 쓰러진 당시 기온이 14.9도였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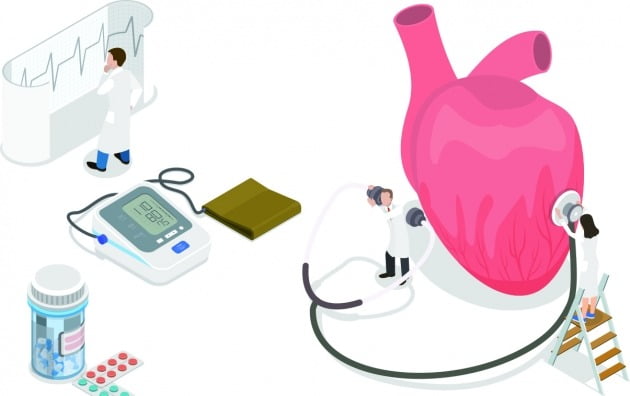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짧은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한 후 다시 작업을 하러 돌아갔다”며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다”고 인과 관계를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A 씨가 직전 공공 근로 사업과 해당 공공 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추운 날씨에 한 작업이 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 씨의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돋보기]
겨울철 ‘꽈당’ 미끄러짐 사고…누구 책임일까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장소를 관리하는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민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에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 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에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 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도 미끄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있다. 보통 골프장은 겨울철에 땅이 얼어있어 골프티(티샷을 위해 공을 올려놓는 도구)가 꽂히지 않는다며 이용객에게 인조 매트 이용을 권고하곤 한다.
50대 남성 B 씨가 찾은 골프장도 마찬가지였다. B 씨는 티잉그라운드에 깔린 인조 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가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결국 B 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B 씨는 이듬해 6월 C 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인조 매트는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 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C 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 씨 역시 잔설을 털어내고 인조 매트에 올라가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 측의 책임을 40%로 판결해 1500여 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현아 한국경제 기자 5hyu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