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카메라로 담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 길어진 여름과 덥지 않은 겨울, 4월에 내리는 폭설까지. 지구온난화를 가까이서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다큐멘터리는 그 심각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개봉해 바다의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파라시’를 비롯한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지구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 기자가 직접 시청하고 추천하는 넷플릭스 환경 다큐멘터리 세 작품을 소개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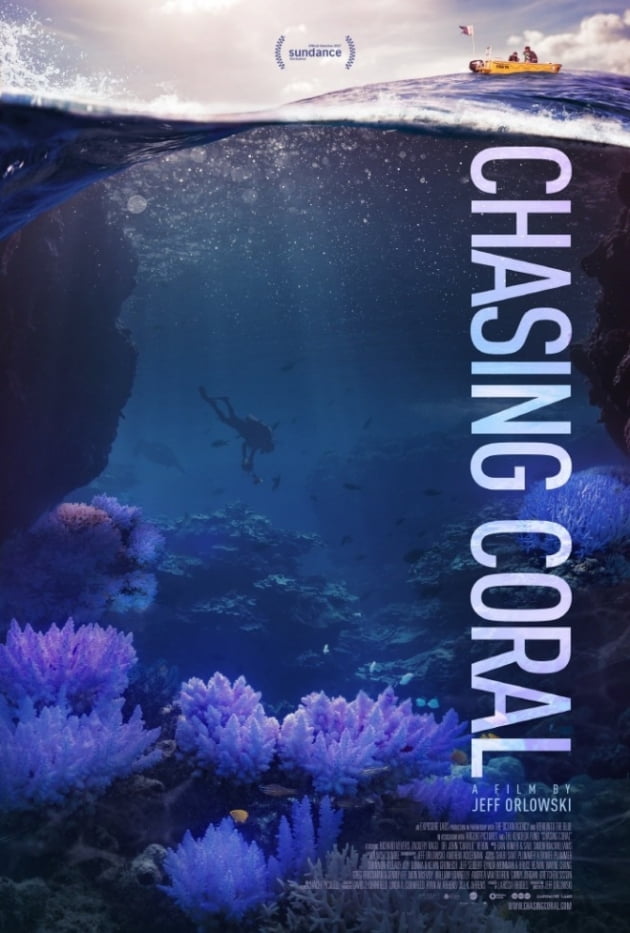
최근 30년간 사라진 지구상의 산호초는 50%다. 지구온난화를 먼저 감지하기 시작한 생물의 최후가 머지않아 보인다. 산호초는 수온에 민감한 바다생물이다. 수온이 2℃ 높아지면 산호초는 하얗게 변한다. 백화현상이다. 산호초 조직 내에 공생하고 있는 미세조류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석회 골격만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과 번식을 멈추고 죽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산호가 형광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스스로를 열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든 것이다.
산호초는 해양생물의 군락지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생물의 25%가 영향을 받는다. 인간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죽어가는 산호의 위에서 선장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죽어가는 산호 위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파괴된 환경을 보며 무기력해하는 촬영진의 모습이 대비된다. 산호초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약 30년이 남았다. 수온이 계속 올라간다면 산호초의 멸종으로 인한 생태계의 균열을 막을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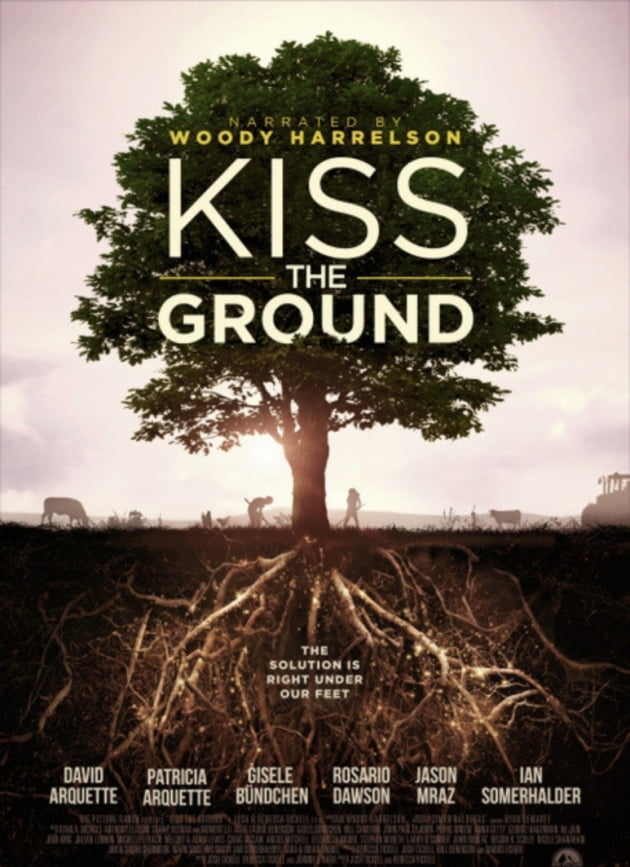
이 다큐멘터리는 탄소가 ‘유해 물질’이 아니며, 박멸해야 할 대상도 아님을 강조한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다.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 것일까.
건강한 토양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하지만 토양이 파괴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방출된다. 수분을 잃어버린 토양은 말라버리고, 흙먼지로 변화한 토양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사막화까지 이어진다.
가장 큰 원인은 화학 관행 농법과 산업형 농업이다. 살충제, 화학비료 등 화학농법이 사용된 토양은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가 제안한 대안은 ‘재생 농법’이다. 경운을 하지 않고 다품종을 한 땅에 기르는 방식이다. 다양한 작물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영양분이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 경운기 역시 표토를 파괴하지 않게끔 얕게 땅을 파 종자를 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재생 농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가진 것을 소비자다. 소비자, 즉 시장이 재생농법을 지지해야 한다. 재생 농법으로 수확된 식물을 소비하고 윤리적으로 도살된 육식만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변화에 힘이 실릴 것이다. 또 어떠한 토양의 변화가 있는지는 다큐멘터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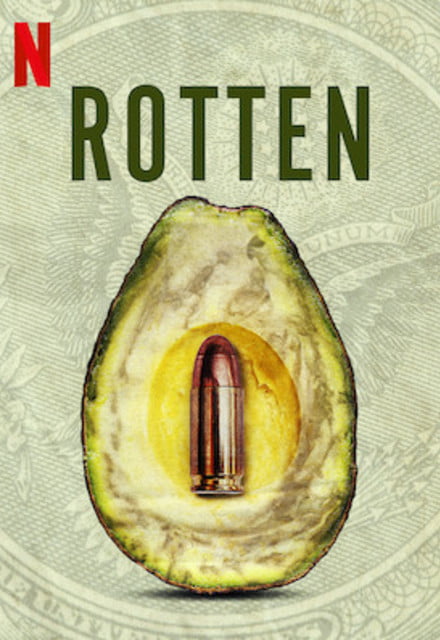
<부패의 맛>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과 국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 다큐멘터리로 일반 환경 다큐멘터리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그중 두 번째 시즌 에피소드인 ‘물을 거래하다’는 생수 산업을 둘러싼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생수업계의 매출은 연간 350억이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물은 호수나 개울이었을 수원지에서 나온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네슬레는 수원지를 찾아 물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약 7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다.
공공재인 물을 일반 기업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산 후 병에 담으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것이다. 생수 수요와 함께 늘어난 플라스틱 물병도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는 이윤 창출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식품 산업의 민낯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공공 용수를 기피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기업들의 물 장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