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직면한 일본기업, M&A 통해 IT경쟁력·해외시장 점유율 높여
한국 기업도 ‘사토리 경영’ 통해 미래 생존 고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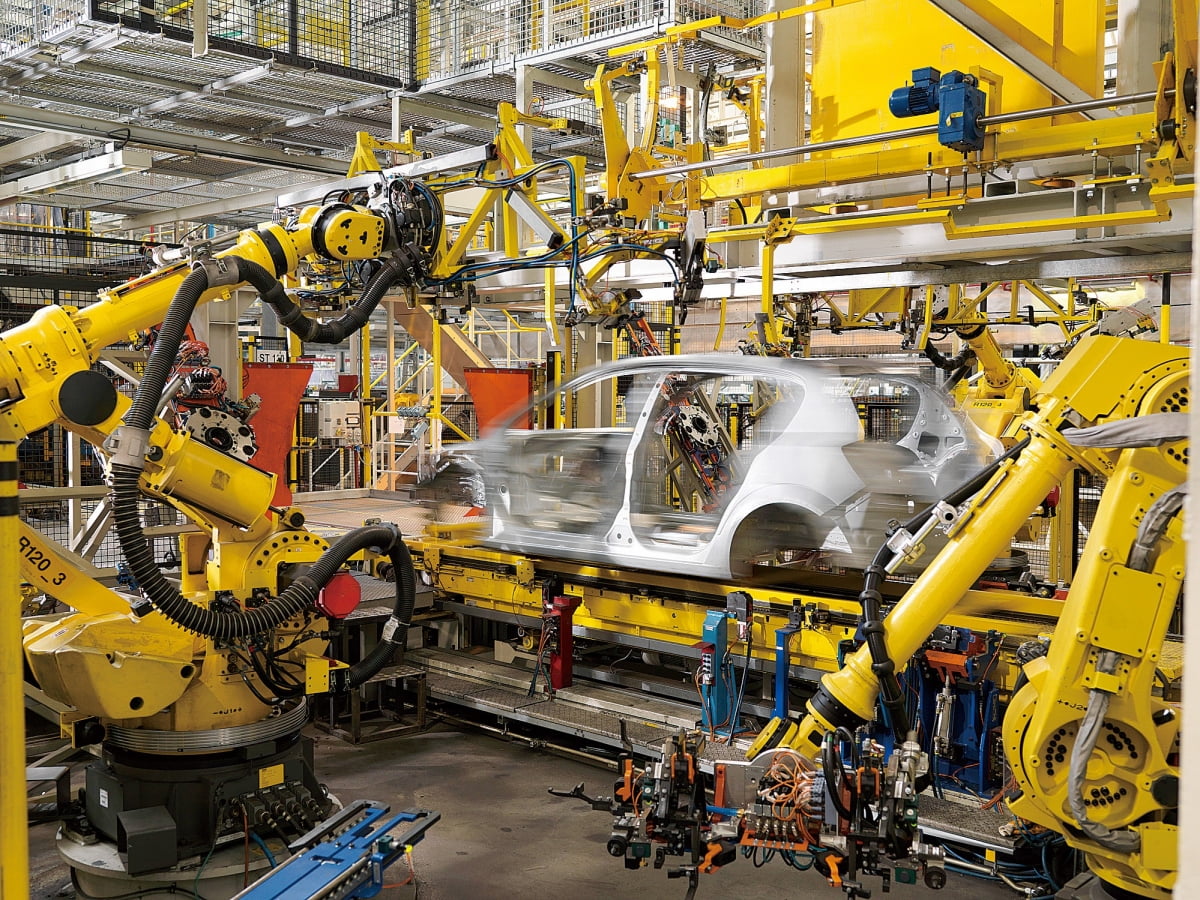
한국 측 경쟁상대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3곳의 2023년 매출 예상치는 508조원으로 지난 5년간 28% 늘었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34조원에서 27조원으로 21% 감소했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와 디지털화의 변혁기에서 뒤처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던 일본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히타치와 세계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전자에 내준 이후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한 소니, 전기차 대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종종걸음 할 때, 일본 기업들은 성큼성큼 뛰어나가면서 두 나라 대표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직전까지 소니의 매출과 순익은 각각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2분의 1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익은 소니가 올해 1조1700억 엔(약 10조7504억원)을 기록하며 7조4486억원을 달성한 삼성전자를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영업이익에서 뒤진 건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반도체 시장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꺾인 영향이라지만 21세기 들어 처음 역전을 허용했다는 상징성은 크다.
2019년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매출과 순익 차이는 각각 200조원과 20조원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매출과 순익 격차가 270조원과 30조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도요타자동차의 격차도 벌어졌다. 2022년 도요타와 삼성전자의 매출 격차는 약 30조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2023년은 170조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 기업, 생존 위해 혁신 나서
지난 10~20년간 한·일 격차가 줄어든 원인으로 “일본 기업이 ‘인구 1억2500만’의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내수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적어도 일본 대표 기업만 놓고 보면 옛날얘기다. 이들 기업은 과감한 사업재편으로 비대한 몸집을 슬림화하고,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정보기술(IT) 경쟁력과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아베노믹스 시절 일본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두렵지 않았던 데는 저금리와 엔저(低)에 기댄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적이 일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된 덕분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물었다.
반면 M&A로 비주력 사업을 잘라내고, 주력 사업에 IT를 접목해 세계시장에 나선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쟁상대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최대 가구회사인 니토리홀딩스, 세계 최대 모터회사인 NIDEC(옛 일본전산)까지 포함시켜 일본 대표기업들의 변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화, 사업재편, 디지털대전환(DX), 기업 M&A. 다시 살아난 일본 기업의 네 가지 공통점이다. 히타치, 소니, 도요타, NIDEC, 니토리는 자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21세기 들어 처음…삼성전자, 소니에 영업익 따라 잡힌 배경은? [글로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D.35735818.1.jpg)
올 상반기 NIDEC 매출에서 일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불과했다. 나머지 83.7%가 해외에서 나왔다. NIDEC은 미국(24.3%), 중국(23.6%), 유럽(20.6%)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고르게 제품을 팔았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가 맥을 못 출 정도로 일본을 제패한 니토리는 현재 3.8%인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 대표 기업들도 물론 위기를 겪었다. 이들을 변하게 만든 건 생존 경쟁이었다. 히타치와 소니 등 일본 전자기업들은 2000년대 대규모 적자가 반복되는 암흑기에 빠졌다. 니토리는 일본 유통업계에서 ‘지옥’으로 평가받는 ‘홋카이도의 불황’을 넘었다. 홋카이도는 거품경제가 붕괴한 뒤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에서도 소비시장이 척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시장 속 경쟁, 사업재편·DX가 필수
세계로 나가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업재편이 필수였다. 히타치는 지난 15년간 사업의 중심을 내수시장, 대량생산 제품에서 글로벌화와 IT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모태사업과 주력사업을 팔아치우는 모험도 감수했다. NIDEC은 모터 일변도의 사업을 자동차 전장사업과 공작기계 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 재편의 방향을 단순 제조업에서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것도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었다. 니토리는 ‘제조·물류·IT 소매업’이라는 신(新)장르를 개척했다. 물류에 IT를 접목시켜 가구 제조·판매업을 유니클로와 같은 패스트패션(SPA) 산업으로 진화시켰다.
히타치는 인프라의 디지털전환(DX)을 돕는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서비스업체로 변신했다. 소니는 콘텐츠 제작부터 배급까지 새로운 사업 생태계를 창출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끝인 제조업을 구독경제와 플랫폼 사업과 같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모델로 진화시켰다.
사업재편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M&A를 선택한 것도 닮은꼴이다. NIDEC이 지난 40년간 성사시킨 M&A는 72건에 달한다. 매년 두건 꼴로 기업을 사들인 셈이다. 히타치는 지난 10년간 M&A에만 4조 엔 이상을 쏟아부었다. 니토리는 필요한 M&A라면 경쟁사가 교섭 중인 인수 대상을 가로채는 등 일본 재계의 불문율을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저명 투자가인 이이 데쓰로 커먼스투자신탁 창립자 겸 대표는 앞으로 3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토리(SATORI) 전략’을 든다. 일본어로 ‘득도’, ‘깨달음’이라는 뜻의 사토리는 사회기여(Society)와 민첩한 변화(Agility), 기술(Technology), 해외 진출(Overseas), 복원력(Resilience), 융합(Integratio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다시 살아난 일본 기업들은 모두 사토리 전략에 정통했다.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경영의 시대를 맞아 주력 사업을 IT와 접목시켜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민첩한 변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노나카 이쿠지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리스크를 과잉 관리한 나머지 현상 분석을 중시하는 경영에 치중한 결과 테슬라와 같은 ‘게임체인저’가 되지 못한 것이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혁신은 리스크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때 탄생하는 것”이라며 “(되살아난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화의 본질을 쫓는 경영모델을 통해 조직의 의식을 철저히 바꿨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 기업들 역시 앞으로 3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토리(SATORI) 경영’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