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중국·인도서 생존해
독자적 경쟁력 갖춰야 각국서 고객 지지 확보 가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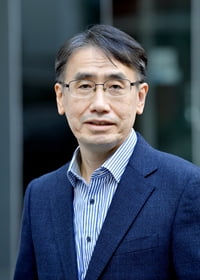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미·중 마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전략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 기업은 정부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 문제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로 인해 현지 중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고전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자동차 산업을 제패하기 시작한 중국 전기차 메이커인 BYD가 도약하고 닛산자동차 등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닛산에 납품하던 기누가와고무공업은 BYD와의 비즈니스 확대에 성공했다. 동사는 BYD 외에 중국 기업과도 거래 관계를 강화할 전략이며 동사 이외의 일본 자동차 부품사도 중국 기업과의 거래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적 반감을 극복하고 중국 유아 포유병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피죤사는 미·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동사는 각종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품질의 강점을 중국 시장에 맞게 응용하면서 제품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사의 포유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니즈에 대응한 기술개발 성과로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제품을 인간의 유방과 유사하게 만들고 유아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가 호흡을 하면서도 확실히 분유를 마실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동사의 샘플을 그냥 배포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해서 제품 개량에 주력하고 있다. 동사의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화의 후퇴와 보호주의 속에서도 글로벌하게 고객을 위한 연구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에 뒷받침된 강점을 현지 사정에 맞추는 전략, 즉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베트남,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일본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 각종 솔루션 수출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일본 기업도 제조업 디지털화에 맞게 인도 거점에서 인도인 IT 인력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은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 Software Defined Vehicle)를 추진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 있어 인도를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도는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성장 중이다. 스즈키자동차는 이러한 인도 내수시장에서 판매대수 1위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주변의 중동,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해 인건비가 높고 제조 기반이 약해진 선진국 현지 생산에 적합한 신생산 시스템의 구축도 과제가 되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을 현지 사정에 맞게 개량해 왔으며 배터리 등 현지 부품 생산에 직접 진출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중 마찰과 보호주의 강화라는 장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자적 경쟁력, 차별성으로 세계 각국 고객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진출 지역의 사정에 맞는 현지화 노하우도 축적하면서 원가를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인도 등 새로운 유망 지역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면서 각 지역에서의 현지화를 위한 인수합병이나 제휴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본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현지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법률, 세제, 정책, 문화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전문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양성 기반을 국가적으로 강화해 우리 기업이 한국에 글로벌 본사를 두고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