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다. 많은 사건 가운데 이런 신뢰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1998년에 발생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TCM) 사태다. 당시 러시아 모라토리움(국가부도) 사태로 LTCM이 파산 직전에 몰리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 세 번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한 긴급조치 덕분에 LTCM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됐고 시장참여자들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그린스펀의 능력을 맹신하게 됐다. 위험을 상쇄시키는 이런 능력 때문에 증시의 침체로부터 옵션 보유자를 보호하는 풋 옵션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이란 용어까지 탄생했다.
그린스펀에 뒤이은 벤 버냉키 Fed 의장은 취임 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수위에 따라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적이 있다. 인플레 우려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버냉키 충격(Bernanki shock)’이라 불릴 정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반대로 인플레가 통제 가능해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버냉키 효과(Bernanki effect)’라 표현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문제는 불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런 현상이 교차됨에 따라 증시참여자들이 버냉키 의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갈수록 비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증시참여자들이 느끼는 피로도인 금융스트레스 지수(financial stress index)가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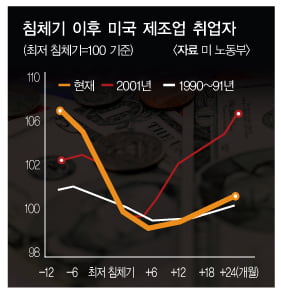
버냉키 콜이란 잦은 말바꿈으로 시장참여자들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옵션 보유자를 보호하지 못해 만기 이전이라도 권리행사를 촉진시키는 콜 옵션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버냉키 콜이 발생하면 앞으로 경기나 기업 실적과 같은 기초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보유 주식이 출회돼 증시는 지금의 조정국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그린스펀 풋과 버냉키 콜이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여부에 따라 중앙은행 총재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경우 그린스펀처럼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Fed 역사상 최장수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밀어주고(put),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부름(call)으로 임기 이전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월가에서 버냉키 의장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다. 버핏 회장은 연일 미국 경제와 국가 신용등급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 주식을 살 것을 권한다. 반대로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 앞날에 강한 회의론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팔아 현금을 보유할 때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렸다. 버핏 회장은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월가는 여전히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루비니 교수는 거듭된 비관론이 들어맞지 않아 신뢰가 예전만 못하다. ‘버핏 풋’과 ‘루비니 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증시 앞날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때다.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