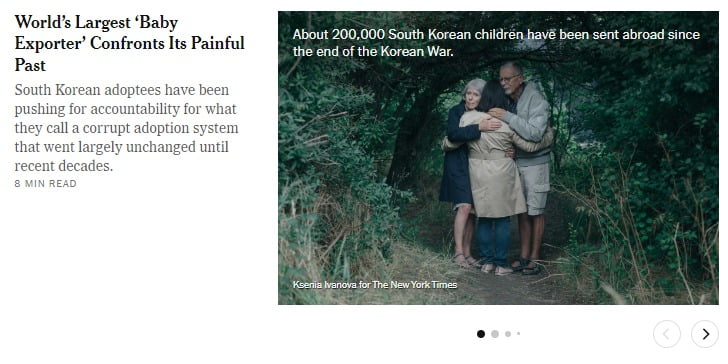
NYT는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민족)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해외 입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실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약 20만 명의 어린이가 해외로 입양됐으며,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만 명의 입양아 중 단 3%만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매체는 한국의 ‘아기 수출’이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와 혼혈아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 이념이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NYT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최대 아동 입양기관 홀트의 부청하 씨가 처음 맡은 업무는 미군기지 근처에 있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게 혼혈 자녀를 해외 입양 보내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는 미혼모도 편견의 표적이 됐다. 이런 편견과 낙인은 미혼모의 아이를 해외로 떠나보내도록 부추겼다. 부 씨는 당시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20명에 달하는 아기가 홀트로 몰려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떤 아이들은 정보가 없어 의사들이 치아를 확인해 나이를 유추해야 했다”고 말했다. 기관에 도착 직후 사망한 아이들은 출생 및 사망 등록 모두 하지 못한 채 홀트 소유의 땅에 묻혀야만 했다.
NYT는 한국이 1970년대에 해외 입양 중단을 고려했지만, 1980년대 ‘이민과 민간 외교 추진’ 명목하에 입양 산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을 ‘아기 수출국’이나 ‘우편 주문 아기’ 등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NYT가 입수한 한국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1985년 한국에서 8천837명의 아기가 해외로 입양됐는데, 입양 기관들은 아기 한 명당 수수료 3천~4천 달러에 1천450달러 항공료를 받았다. 또 입양기관들이 미혼모 보호소를 운영하며 아기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2005년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과거 입양 산업 부패 조사를 요구했지만, 국가 차원의 시선을 끌지 못해 좌절되었다.
다만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착수됐다. 이에 대해 NYT는 해외 입양 34건의 조사 결과를 내년 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겪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국제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여전히 세계 3대 아기 수출국이다. 한국의 국외 입양아는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