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머니 =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미술사 박사]
짙푸른 모노톤의 소나무 색채와 역광의 하모니가 빚어낸 이른 아침 깊은 숲속의 정경.
그곳엔 길이 있다. 빛의 길이다. 시원(始原)의 끝에서 시작된 그 길은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의 터널이다. 도성욱 작가의 작품은 사진이라고 착각할 만큼 기가 막힌 손맛의 그림이다.
도성욱 작가의 작품은 일명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룬 추상적인 모노톤 숲 시리즈’로 이름났다. 촉촉한 숲 그림의 한 전형을 이뤄 국내 미술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구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수채화와 유화를 넘나들며 빼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가령 한국수채화공모전 특선(1995년), 목우회공모전 특선(1999년) 수상은 당시 20대 작가에겐 큰 수확이었다. 30대에 접어들어선 대구·경북 지역 신진 유망 작가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으로 여겨진 제13회 고금미술작가상(2001년)에 이어 MBC 금강미술대전 대상(2004년)을 거머쥐며, 도성욱 스타일의 확고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도 작가의 그림은 ‘실재와 허구가 혼재하는 풍경’으로 평가할 만하다. 찬란하게 쏟아지는 빛 아래 은은하게 드러나는 숲속의 나무들은 보는 이의 감성을 단박에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다. 마치 엷은 햇살을 등지고 촉촉한 빛줄기로 샤워를 마친 생동감 넘치는 기분이다.
겉보기엔 정말 인쇄한 것처럼 섬세하고 정밀한 붓 터치가 돋보이지만, 작품의 제작 과정은 의외로 심플하다. 말 그대로 즉흥적인 리듬의 결과다. 그의 말을 빌면 ‘그저 마음 가는 색으로 아무렇게 색을 칠하다 보면 붓이 움직이는 동안’ 어느덧 완성돼 있는 격이다. 머릿속에 어떤 상황을 연출할까 하는 계획이 떠오르면, 자동기술법처럼 붓을 든 손끝이 화면 이곳저곳을 누비게 된다. 저지르고 뒤에 수습하는 그런 방식인 셈이다. 그래도 연속적으로 쉼 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흡사 수도자가 수행하는 모습이다.
도 작가는 전혀 인위적인 연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면의 느낌에 충실한 ‘무기교의 기교’를 화면에 보여준다. 나무 기둥이 모자란다 싶으면 더 그리고, 이파리의 조화로움은 그때그때 유기적인 생각의 리듬에 맞춰 덧붙여 간다. 임의로 만들어 갈 뿐 처음부터 계획한 구상 같은 건 없다. 마지막 단계에 빛의 표현을 입게 되면 그만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무위자연에 대한 단상이 화폭에 고스란히 펼쳐진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도 작가의 회화는 얼핏 겉보기엔 전형적인 구상화법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꿈속에서 본 환영을 실존하는 풍경으로 재정립시켜 온 그동안의 작품들은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넘나든 독창적인 화면’이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실존에 가까운 허상이 아니라, 허상처럼 느껴지는 환상적인 실존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미세한 붓 터치를 수도 없이 겹쳐 좀 더 포근하고 안온한 숲의 정경을 선사하고 있다. 더욱이 화면 위에 구사된 빛의 섬세한 조율은 보는 이에게 더없이 풍성한 시각적 충족감을 더해주기에 충분하다.
도 작가의 빛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우선 초기 작품들은 빛이 숲속의 녹색 기운에 한 번 걸러져 간접조명처럼 부드럽고 은은함을 자아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출처나 시발점을 직접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빛의 정체가 더욱 명확하게 출현한다. 초기일수록 빛의 조도(照度)로만 숲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하루 중 어느 때인지 정확치 않은 모호하고 은은한 표현이 많았다. 거기에 촉감이 가미된 빛의 조율이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0년 전후로는 일출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아침나절이나 하루를 마감해 가는 석양 무렵처럼 시간대가 좀 더 명확해진 작품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 작가의 숲은 볼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다. 비록 숲의 골격을 옮겨 놓았어도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실경화(實景畵)’보다 ‘진경화(眞景畵)’에 가깝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로 전개된 숲의 전경은 언뜻 모노톤의 추상화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흡입력을 경험하게 한다. 자연의 근본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빛은 산란하는 눈부심보다 피부로 느끼는 촉감과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에 가깝다. 빛과 어우러진 그런 숲의 특별한 생동감은 간혹 바다 풍경을 담은 물 그림에서도 그대로 전이된다.
초록의 계절에서 시간이 멈춘 듯 상상의 숲이 펼쳐지는 도 작가의 빛 그림. 그 숲은 영혼과 육체의 위안을 주고, 더없이 평온한 휴식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녹푸른 숲이야말로 시원한 해방감의 절정을 이룬다. 세상은 빛으로 인해 형상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 형상들은 빛의 밝음과 어두움을 만나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 우리의 인식을 깨운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형상 그 이전의 근본에 대한 물음의 답을 빛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빛은 삶을 향한 진한 경외감으로 비춰진다.
도 작가의 숲 그림은 온몸에 산재한 감성의 촉수로 빛의 촉감을 느낄 때 비로소 제대로 살아난다. 그의 침엽수 소나무 숲은 날카롭기보다 오히려 포근하고 푹신하다. 쉼 없이 상큼한 내음이 뿜어져 나온다. 소나무 향은 이해력과 자비심을 불러오며, 솔잎은 예리한 지혜를 모아준다고 했듯, 그 역시 숲으로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그에게 길은 이미 오래전 수많은 사람이 지났거나 아니면 첫발을 내디딜 처녀지여도 상관없다. 마음으로 걷는 명상의 산책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상의 숲속에서 촉촉한 생명의 빛으로 그만의 시 (詩)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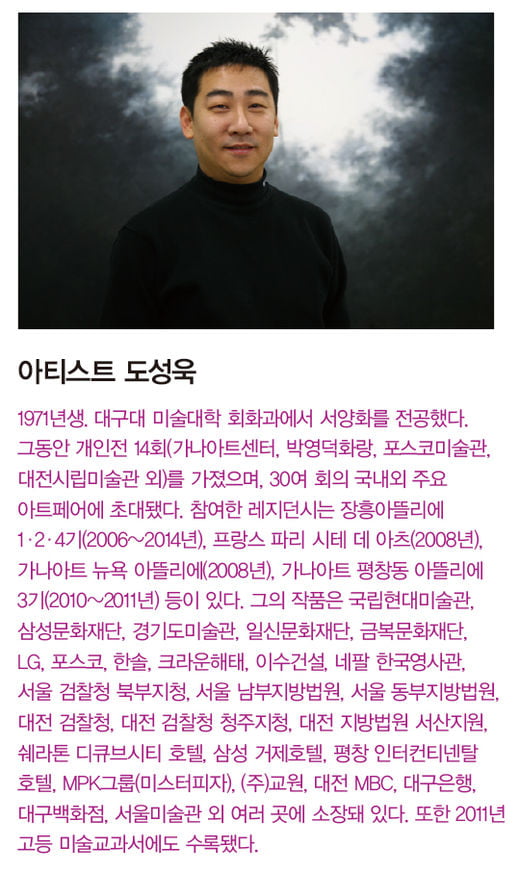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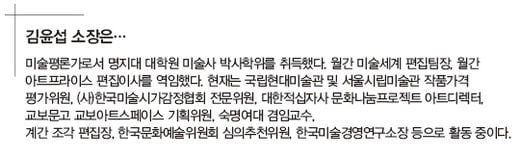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