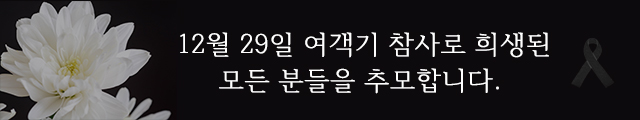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흔들리지 않는 기축통화(세계의 통화)인 달러에 잘 나타난다. 양적완화를 통해 3조 달러가 넘는 어머어마한 규모의 돈을 찍어내도 환율이나 달러인덱스(달러상대가치지수)가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외환시장이나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미약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만7000선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는 것도 다 ‘기축통화 달러’의 덕이다.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알려진 바대로 신용사회인 미국 경제는 부채로 굴러간다. 비유컨대 연간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를 자랑하는 미국 경제는 약 60조 달러의 부채로, 공기가 가득 찬 풍선과 같다. 금융위기로 자산 가격이 폭락, 대규모 자산 상각으로 부채 규모가 줄자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과거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섣부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일본과 달리 망설이지 않고 돈을 찍어냈다.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채우면 풍선이 다시 떠오르듯, 양적완화라는 부채 생산을 통해 돈을 풀어놓았으니 경제가 굴러가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많은 강대국들이 기축통화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꿈꾸는 많은 국가들은 ‘통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트레핀의 법칙’조차 넘지 못했다. ‘트레핀의 법칙’을 통과해도 기축통화에 오르는 길은 지난하다. 경제 1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경제 1위국에 올랐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로 등극하는 데는 수십 년이나 걸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축통화 국가가 되려면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외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경제 기상도는 달러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때 달러를 위협했던 일본의 엔이나 유로화는 각각 턱없이 작은 경제 규모나 자체 결함 때문에 달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요즘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는 위안화도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의 형국이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는 차지하고 그 전 단계인 통화의 국제화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우선 채권이나 외환시장부터 개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성급한 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잘 아는 중국이 언제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달러가 영원히 기축통화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내부의 문제로 달러 가치가 붕괴되거나 여러 나라들이 연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빈부 격차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 미국이 그러한 병폐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달러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중국 혼자서는 어렵지만 만약 러시아나 인도가 힘을 합쳐 새로운 통화를 만든다면 앞서 키신저 전 장관의 예언은 조기에 실현될 수도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축통화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종환 농심캐피탈 사장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