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짧은 시간 동안 아트시는 세계 미술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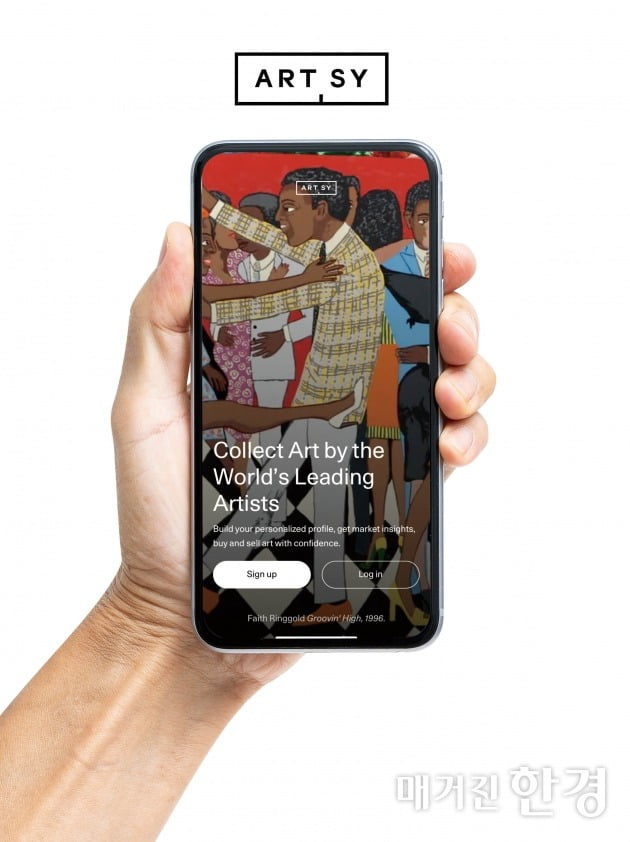
이는 작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아트는 일반 대중이 아닌, 부유한 특정 계층을 위한 리그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적 특권 같은 것이기에 폐쇄성과 희소성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 특권을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온라인에서 판다는 건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2012년 ‘아트시(Artsy)’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아트시 창립자이자 CEO인 카터 클리블랜드(Carter Cleveland)는 미술을 사랑하는 부유한 금융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였다. 어릴 때부터 예술의 ‘세례’를 받고 자란 카터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이 공학도는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 방을 보고 크게 당황한다. 평생 미술 작품이 가득 걸린 벽을 보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숙사의 벽은 초라하기만 했던 것이다. 기숙사 방 벽에 좋은 작품을 사서 걸고 싶었지만, 온라인에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미술품이 거의 없었다. ‘아트시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물론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스물두 살 남자가 유명 갤러리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사이트를 만든다는데, 누가 호응을 해주겠는가. 하지만 이 젊은 CEO는 우여곡절 끝에 ‘가고시안’과 ‘페이스 갤러리’ 같은 대형 갤러리를 입점시키고, 대규모 투자까지 이끌어내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 결과 현재 아트시는 전 세계 갤러리에 속한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바로 구매로 연결하는 논스톱 아트 쇼핑 사이트 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굳이 작품을 실물로 볼 필요도 없다. 아트시가 구축한 디지털 갤러리는 오프라인 그 이상이다. 화면상 작품의 이미지는 작가의 붓 터치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높다. 내 방에 두었을 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모든 작품을 스타일과 시기 혹은 가격으로 필터링할 수 있고, 막강한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해 작가와 작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각종 전시와 경매 소식은 물론 명망 높은 큐레이터들이 쓰는 수준 높은 미술 기사도 제공한다. 굳이 아트시를 떠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아트시와 계약을 맺은 갤러리는 3000곳 이상이며, 사용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
특히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상황은 아트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갤러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작품을 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고립감과 정서적 상실감을 달래기에 미술만큼 좋은 소비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트 컬렉터뿐 아니라 처음 아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초보 컬렉터들도 자연스럽게 아트시로 유입됐다. 온라인 아트 마켓을 다루는 ‘히스콕스 리포트’의 2022년 버전에 따르면 젊은 컬렉터의 31%가 자신의 첫 작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했고, 컬렉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 컬렉터 중 47%가 자신의 첫 컬렉팅이 온라인이라고 답했다. 아트시 같은 온라인 아트 마켓이 갤러리나 경매장에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구매자들을 위한 입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미술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는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아트시에 가장 많은 신규 컬렉터가 유입된 성장률 1위 국가로 꼽혔다. 현재 아트시에서 활동하는 한국 컬렉터 수는 지난해보다 2.3배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아트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트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취향을 개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수백억 원짜리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목에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취향과 안목을 믿지 못한다. 순간의 착각으로 큰돈을 잃을 수 있는 값비싼 그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다. 예를 들면 갤러리의 큐레이터나 미술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컬렉터들은 자주 갤러리에 들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신의 안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아트시는 안방에 앉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작품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추천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트시의 알고리즘은 사실상 미술 교육 과정과 같다. 내 취향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아트시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아트시의 가장 특별한 점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거침없이 성장해온 아트시에는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景氣)가 좋지 못하다.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자산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다. 내 집값이, 내 주식이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아트는 무용지물이 된다. 먹고사는 일이 예술보다 훨씬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삶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다. 예술이 없다고 삶이 무너지진 않는다. 최상위층 거부에게는 다른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컬렉터에게 경기 침체는 상당히 거북한 신호다. 결국 아트시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일지 모른다. 예술보다 생존이 중요해진 세상이 오면 아트시는 예술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글 이기원 칼럼니스트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