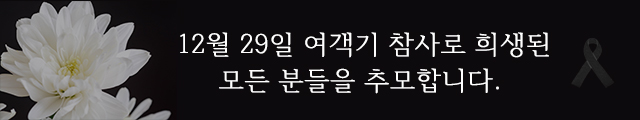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미국에 있다가 1998년에 서울로 들어와 개업을 했을 때쯤 우연히 연이 닿아 안산의 고향마을이란 곳에서 치과 의료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고향마을은 한국으로 귀화한 사할린 동포 2세들이 모여 사는 공동 주거지역이에요.
그저 고향이 그리워 오신 분들이라 사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틀니를 많이 해드렸죠. 당시엔 저희 치과에 의사가 저를 포함해 세 명 있던 때였는데, 그렇게 2년 정도 고향마을을 꾸준히 찾아갔었죠.”
탈북자들과 함께 한 12년 치과 의료 봉사
그렇게 2년이 지난 뒤 윤 원장은 탈북자들을 마주하게 됐다. 그의 의료 봉사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원’이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다.
1999년 7월에 경기도 안성에 설립됐고, 탈북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경기도 분당에 분원이 생겼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기초 직업교육 훈련도 받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1기부터 치과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00기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살면서 단 한 번도 치과를 방문한 적이 없어 난생 처음 스케일링을 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른들의 경우 보철 치료, 틀니 제작, 신경 치료 등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해 드립니다.
직원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하나원을 방문했는데, 많을 땐 하루 30명까지 치료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틀니 잘 쓰고 있다’며 연락을 해오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예전만큼은 자주 못가고 있네요.”
하나원을 찾은 지가 벌써 12년이니 유 원장의 손을 거쳐 간 환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유’하나 찾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넌 사람들을 치료해주다 보니 그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가 됐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다.
“주로 가명을 쓰시는데 그중에 김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치료하는 중에 탈북 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부력으로 몸이 뜰까 봐 하의는 팬티만 입고 아이는 등에 업은 채 아내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는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사살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요. 하나원 입소자 중에는 탈북하기 전 중국에서의 장기간 도피 생활로 아픔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말씨만 다르지 그토록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티는 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바라보는 한 방향 ‘나눔’

서민들에게는 꽤 큰 목돈이 들어가는 틀니 제작은 물론 소소한 치료에 드는 비용도 모두 사재로 충당했다.
유 원장의 의료 봉사가 입소문이 나자 나중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보철 치료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그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의치와 틀니를 만들어 주는 랩(lab)에서도 나중에는 십시일반 도움을 보탰다고.
하나원 치과 의료 봉사에 이어 최근에는 대한치과협회와 함께 소년소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봉사도 진행 중이다.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무료 치과 치료 지원도 그가 하는 나눔 활동 가운데 하나. 기독치과의사회와는 수시로 카자흐스탄 등 해외 의료 봉사를 나가기도 한다. 서울 강남에 있는 치과 원장의 라이프스타일치고는 솔직히 좀 유별(?)나다.
“아, 아닙니다. 저 말고도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요.(웃음) 저는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의료가 상업화되는 시대에 의사로서의 철학과 본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혹자는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자들과 진솔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들에게 평생 필요한 평생 주치의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WY치과를 찾는 사람 가운데는 이민 간 뒤에도 한국 방문 때마다 치과 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 미국에서 운영하던 치과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애써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단골 손님의 40%는 외국인 손님.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유 원장의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굳이 한국 치과 의사를 찾는 데는 한국인 의사 특유의 ‘손맛’ 때문이기도 하다. 학부에서 화공학을 전공했던 그가 진로를 바꿔 치과 의사로서의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은 그에게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물었다. 10여 년간 철인 3종경기 올림픽 코스를 4번이나 완주했다는 그의 열정만큼이나 많은 리스트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교육받고, 또한 나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아내와 부부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동갑내기인 아내(그의 아내는 송경애 BT&I 여행사 대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지칭하는‘아너스 클럽’멤버다)와 함께 조금은 막연하게 오십이 되면 기부재단을 하나 만들자고 마흔 살이 될 때 약속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십이 되고 나니 너무 이른 감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영(young) 하다고 할까요.(웃음) 그래서 10년 정도 늦췄어요. 예순쯤이면 저도 치과 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두 아이 이름을 딴 ‘A & W 재단(Andrew & Walter Foundation)’으로 이름부터 짓고 재원 마련부터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생각보다 심플한 버킷 리스트다. 미국에서 공부 중인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두 아들은 어머니가 공수해 준 한국산 컵라면을 학교에서 팔아 모은 돈으로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누들 보이스(noodle boys)’로 캠퍼스에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나눔’에 관해서는 못 말리는(?) 유 원장과 그 가족의 이야기. 이들이 퍼뜨리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굳이 백신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유원희 현 WY치과 원장
인천 제물포고 졸업
미국 리하이대 BS
뉴저지 의과 및 치의예과대 DMD
미 컬럼비아대 MPH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