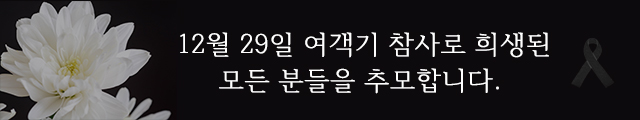집, 소설책, 역사서 등 책에도 종류가 있듯 미술도 마찬가지다. 시처럼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도 있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히는 작품도 있고, 역사처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작품도 있다. 작가 리경의 작품을 책에 비유하자면, 철학서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연기와 함께 피에타의 예수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설치 작업, 눈이 부시도록 환한 흰 공간을 형상화한 작업 등은 그 의미를 단박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그녀가 작업을 통해 던지는 명제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 어찌되었든 인터넷 소설 같은 흥미위주 책이 대세인 출판계와 다를 바 없는 요즘의 미술계에서, 리경의 작품은 인문학 서적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그녀의 작품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성경 속 이야기. 그러나 성서 속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중세 시대 종교화와는 다르다. 그녀가 성경을 택한 것은 그 속에 등장하는 질시, 반목, 질투 등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다를 바 없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국화를 전공한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작업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던 때에 해법을 준 것도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장르를 불문하고 미술은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녀는 동양화뿐만 아니라 서양화도 배워보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부 때와는 다른 전공으로 석사 진학을 하기가 여의치 않았기에 영국 유학을 결심했다. ‘한국화 하는 애가 대만도 아니고 무슨 영국이냐’는 비아냥을 뒤로 하고. 영국 외무성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세등등하게 첼시 국립 미술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그때의 좌절감이란! 누구나 그렇지만 그녀 역시 최고가 되고 싶었다. 성적표에 등수가 안 적혀 있어도 자신이 학급에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법. 동급생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 있는 그녀를 본 학장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먹으로 하는 건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열등생으로 느껴져 힘들어요.” “그럼 자신 있는 걸 해.” “그건 동양화잖아요.” “어쨌든 그림이잖아.” “해도 돼요?” “해도 되냐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봐."그랬다. 다양한 화법을 구사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으면서 막상 영국에 가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었던 것. 다음 날 그녀는 작업실 바닥에 종이를 11m 정도 깔고 차이나타운에서 사온 먹을 가지고 청소용 대걸레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그는 비로소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8년여간의 영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2002년 성곡미술관이 주최한 기획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가이자 기획자로 참여한 전시 <금단의 열매>는 ‘성경’을 모티브로 이를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공통된 테마 아래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조각, 애니메이션, 페인팅,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전시. 이때 리경 작가가 선보인 작품은 공간 전체를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후 오징어잡이 배에 다는 집어등을 달아 눈이 부실만큼 환하게 만든 설치 작업 ‘지식의 나무(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였다.“선만 있으면 악을 모르고 마찬가지로 악만 있으면 선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인거죠. 그렇지만 인간에 의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작업은 이기적인 자아를 비우는 노력 없이는 어떤 종류의 지식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한 빛이 흰색 벽면에 부딪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밝게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눈을 감게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어떤 종교든 수양을 할 때에는 눈을 감듯 시각 활동의 정지 없이 마음속의 탐욕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은 제레미 벤담의 ‘펜옵티콘’을 응용한 작품. 펜옵티콘은 원형으로 설계된 감옥의 청사진으로 중앙 경비소를 중심으로 독방들이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 있는 형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방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반면 경비소는 어두워야 한다는 사실. 이럴 경우 감시자가 있는지 여부를 모른 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매순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마련이다. 단지 설계와 불빛을 이용했을 뿐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펜옵티콘은 어느 감시 체계보다 놀라운 효율성을 지녔다. 작가가 주목한 것은 이와 다르지 않은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골목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중앙 컴퓨터에 모두 기록되지 않는가. 편리를 위한 현대 문명에 사람들은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펜옵티콘 디오라마(Diorama, 모형을 설치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든 것)에 서 있는 사람 모형은 악수를 하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비춰지는 그림자는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는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크든 작든 현실의 문제를 인지시키는 것이 작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자까지의 역할인 거죠.”이 외에도 피에타 상에서 예수님 부분만 분리해 조각상을 만들고 아이비를 덮은 작품, 성서 속 이야기를 현실 세계에 빗대 표현하고 이를 렌티큘러로 만든 작품 등 그녀의 작업은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해보게끔 하는 힘을 지닌다. 그러나 지난 해, 이런 그녀의 작가관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함평 축제의 일환으로 작업한 카우 퍼레이드가 바로 그것. 1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실물 크기의 소 모형에 페인팅이나 조형 작업을 해서 야외 공원에 설치하는 이벤트에서 그녀의 작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이다.“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눈에는 속눈썹을 길게 붙이고, 몸체에는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문양을 새겨 넣고 ‘암소 핫(I'm so hot)’이라는 작품명을 붙였어요. 뭐랄까,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치듯 만들었던 건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어요. 이전의 작업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 얘기를 듣는 사람도 고려한 작품을 해야겠다고 말이죠.”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그녀는 코엑스와 아파트 단지 등에 놓이는 공공미술 작업에도 참여해 그에 맞는 작업을 구상 중이다. 그렇지만 리경 작가의 이런 외도가 조금도 염려스럽지 않은 것은 그녀의 작품관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설가 김훈이 통속 소설을 쓴다 해도 김훈은 김훈 아니겠는가.설치미술 작가리경글 정지현 미술전문 칼럼니스트·사진 서범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