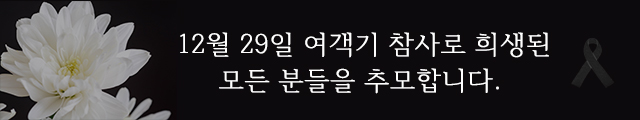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TASTE THE WORLD] ‘별미’ 없는 스위스, 우리는 자연을 먹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94040.1.jpg)
퐁뒤, 거칠한 빵과 부드러운 치즈
그 강렬한 조화
우리의 김치처럼 이들의 밥상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치즈다. 스위스는 대표적인 낙농 국가로, 알프스의 드넓은 초원에서 자란 젖소에서 추출해 낸 치즈만 500여 종에 달한다. 중부 베른 주의 에멘탈에서 만들어진 에멘탈 치즈는 스위스 치즈의 대명사다. 노란 빛깔에 동그란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 치즈는 만화 영화 ‘톰과 제리’에 등장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TASTE THE WORLD] ‘별미’ 없는 스위스, 우리는 자연을 먹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94041.1.jpg)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유러피언 비스트로 ‘가스트로 통’의 롤란드 히니(Roland Hinni) 오너 셰프는 스위스 베른 출신으로, 그 지방 치즈인 그뤼예르를 기본으로 에멘탈, 아펜젤러 치즈를 섞어 퐁뒤를 만든다. 그는 먼저 커다란 포드(pod)를 가열한 뒤, 반으로 자른 마늘 즙을 둘렀다. 퐁뒤에 은은한 갈릭 향을 풍기기 위함이다. 2~3가지 다른 치즈를 넣고 ‘키르시’라고 불리는 체리 증류주와 화이트 와인을 부은 뒤 계속 저어 가며 은근한 불에서 끓였다. 이는 히니 셰프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니, 레스토랑에서 그는 추억을 파는 것이다. 포드 속의 치즈가 서로 엉키도록 전분을 살짝 넣고 마지막에 키르시를 조금 더 가미해 풍미를 낸다. 여기에 넣는 후추와 너트 맥은 향신료 역할을 한다.
이 치즈에 찍어 먹는 빵은 수분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그냥 먹기엔 아주 딱딱한 바게트여야 한다. 그래야 포크에 잘 찍힐 뿐 아니라 거칠거칠한 빵과 부드러운 치즈가 빚어내는 극과 극의 식감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가스트로 통에서는 손님이 기호에 따라 데친 토마토와 버섯,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함께 제공한다. 히니 셰프에 따르면 퐁뒤는 여럿이 모여 함께 먹어야 한층 맛있고 의미가 있는 음식이다. 따라서 퐁뒤에 얽힌 재밌는 식문화도 여럿이다. 가령, 빵을 치즈에 떨어뜨린 사람은 오른쪽에 앉은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술을 사야 한다고 하니 사랑 고백에 이만큼 적합한 음식이 또 있을까 싶다.
요즘 스위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포드에 조금 남은 치즈에 달걀을 깨트려 치즈 에그 스크램블처럼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누룽지처럼 치즈가 딱딱해지면 짭조름하면서도 바삭바삭한 것을 포드에서 떼 먹는 재미도 일품이다.
감자 팬케이크와 밀크초콜릿, 스위스 행복지수의 비밀
하지만 퐁뒤는 별식이지 스위스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다. 그들에게 주식은 감자 팬케이크쯤 되는 뢰스티다. ‘바삭하고 노릇노릇하다’란 뜻의 뢰스티는 얇게 썬 감자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것으로 스위스에서는 아주 흔하게 즐기는 요리다. 베이컨, 양파, 햄, 로즈메리, 달걀, 버섯 등 여러 재료를 섞어 오믈렛에 가까운 뢰스티를 먹기도 한다.
그밖에 이들은 곡물 덩어리 뮤즐리와 요거트 등을 주식 혹은 간식으로 먹고 허브티를 수시로 마신다. 과식 문화가 없고 친자연주의 식품들을 주로 섭취해 비만을 낮추니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삶이다. 히니 셰프는 “스위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겸손을 배우고 욕심내거나 비교하지 않는 삶을 배운다”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씀씀이는 음식 문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스위스 음식에 초콜릿도 빠질 수 없다. 밀크초콜릿을 처음 만들어 낸 스위스는 전 세계 초콜릿 소비량 1위에 달하는 국가다. 히니 셰프의 아내인 가스트로 통 김영심 사장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입에 초콜릿을 넣어 주시더라”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취침 전 초콜릿이라니, 그들의 초콜릿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얼핏 단조롭고 무료한 듯 보이는 스위스 사람들의 삶, 하지만 그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위에 오른 건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자연에서 온 특별할 것 없는 건강 밥상 때문은 아닐는지.
서울의 스위스 레스토랑은…
프리미엄 유러피언 퀴진 가스트로 통(02-730-4162)에서는 전 세계 특급 호텔 총주방장을 역임한 스위스 셰프가 만들어 주는 스위스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퐁뒤, 라클렛 등 스위스 가정식 요리와 와인의 마리아주를 경험할 수 있다. 이태원의 알트 스위스 샬레(02-797-9664)는 1982년 문을 연 국내 최초 스위스 요리 전문점이다. 스위스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로, 지금은 스위스 정통 음식과 이탈리안 메뉴를 접목한 요리를 소개한다. 이태원 레만호(02-798-4656)에서는 라클렛, 치킨파이, 퐁뒤 등 스위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윤경 기자 ramji@hankyung.com│사진 서범세 기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