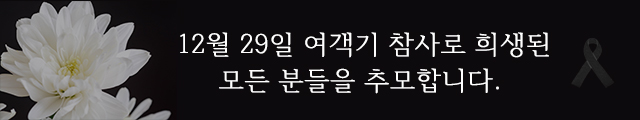대한민국을 만든 고전들_여섯 번째 김승옥의 ‘무진기행’
‘감수성의 혁명’, ‘괴물 신인’이라 불리던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무진으로 가는 여행기다. 어디쯤엔가 있을 법하지만, 한 번도 꺼내놓고 얘기하지 못한 곳.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출세한 남자들이 훌훌 던져 버리고 온 ‘고향’이자 성공과는 무관한 ‘시골’이다. 그렇게 욕망의 기원이 되는 곳이며, 언제나 돌아가지만 이내 벗어나는 곳이 ‘무진’으로 상징된다. 저마다 골방에 가둬 둔 부끄러운 ‘무진’을 꺼내어 기억하게 하는 것, ‘무진기행’의 힘이다.![[GREAT TEACHING] 부끄러움과 욕망 사이, 그 촌놈의 기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94335.1.jpg)
소설가 김훈이 김승옥을 떠올리는 대목은 이런 찬탄이 과하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김훈의 아버지 김광주는 당시 무협소설을 쓰는 작가였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도대체 인간이냐”고 하면서 어떤 신인에 대해 얘기하더란다. 한 작가에 대한 경탄과 시기심이 ‘인간이냐’라는 물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그가 바로 김승옥이다. 그전까지 한국문학계에서 볼 수 없었던 돌연변이, 그만큼 새로웠고 그만큼 다른 인간이었다. 김광주는 김승옥을 떠올린 그 술자리가 파한 후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 새로운 별종 인간을 보는 순간, 이미 자신들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소설 쓰기의 시간이 끝나 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김승옥은 그 등장에서부터 이미 신화였다.
‘무진스러움’이 드러내는 참담할 정도의 야한 속살
지금은 옛날 일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1960년대 김승옥의 등장은 족히 ‘괴물 신인’으로 칭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감수성의 혁명’으로 말해지는 건 예의 이런 ‘괴물’에 대한 헌사라고 해도 좋겠다. 1964년 사상계에 실린 ‘무진기행’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무진’으로 가는 여행기다. ‘무진’은 작가의 고향 ‘순천’이라고 말해지기도 하지만, 이는 ‘무진기행’을 둘러싼 여러 의미들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협소한 해석이다. 어디쯤엔가 있을 법하지만, 한 번도 꺼내놓고 얘기하지 않는 곳. ‘무진’은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출세한 남자들이 훌훌 던져 버리고 온 ‘고향’이자 성공과는 무관한 ‘시골’이다. 그렇게 욕망의 기원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가지만 이내 벗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1941년생 김승옥이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향’이라고 하면 생생한 삶의 단면으로 되비쳐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유년기 기억 속에 있는 예의 ‘그 많던 싱아’로 기억되는 그런 곳이다. 비록 때론 헐벗은 고향이라고 해도 기억 속의 ‘고향’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김승옥에게 고향이란, 그렇게 서정적이거나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방바닥에는 비단 방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라고 쓴 것처럼, 늘 그저 그런 요행이나 허황한 운수만을 기대하는, 늘 그렇게 먼지 쌓인 채로 그 모양으로 그대로 버려진 그런 곳이다. 적어도 도시에서 올라간 이들에게 무진은 그런 곳이다. 유행하는 나일론 치마를 입고 있지만 세련되지 않았으며, 유행가를 부르지만 절규로 들리는 그런 곳. 적어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곳은 벗어나야 하는 곳이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바로 이 성공해야만 했던 자식들의 맘속에 놓인 부채감의 도가니다. 1990년대까지 ‘전원일기’를 TV로 보면서 훈훈한 정서를 되뇌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1964년 ‘무진기행’이 드러내는 ‘무진스러움’은 참담할 정도로 야한 속살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윤희중이 무진으로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배경이 좋은 아내의 힘으로 출세한 주인공, 그는 전무 승진을 앞두고 잠시 고향에 내려간다. 무진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시골이지만 적어도 ‘안개’만은 손꼽을 수 있다. 그 안개란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 같은 것이자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낸 입김과도 같은 것’으로 ‘나’를 잡아먹을 듯한 공포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다면 ‘적군’이나 ‘여귀’의 포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실제로 윤희중은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그렇게 방 속에 붙잡혀 지내기도 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치욕스러운 생존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에게 무진은 골방의 기억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시 찾은 무진은 여전하다. 미친 여자가 무표정한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시체가 방파제 위에서 나뒹굴고 있다. 이들의 얼굴은 낯설지 않다. 그들의 얼굴은 바로 골방에 갇힌 채 누런 얼굴과 더러운 옷으로 뒹굴던 바로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절규, 혹은 죽음. 그런데 윤희중은 무진의 음악교사에게서조차 자기 모습을 다시 보고야 만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에게 오래 붙들릴 수는 없다. 그렇게 연민으로 머무를 수 없다. 서울로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자마자 윤희중은 다시 무진을 등지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부끄러움을 느낀다.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으로 외면해 버린 어떤 진실의 기록
이 작품은 작가 김승옥이 서울대 불문과 시절에 발표한 작품이다. 젊은 작가의 새로운 감각이 그대로 손에 잡히는 작품이다.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게 사실이다. 작가 신경숙은 스무 살 무렵 ‘무진기행’을 한 자 한 자 필사하며 소설 쓰기를 익혔다고 했을 정도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무진기행’의 서술은 독자들에게 한 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고향 무진에서 만난 동창생 ‘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고시를 통과한 후 무진에서 세무서장으로 있는 ‘조’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서술자는 이력, 외양만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그의 성격과 욕망을 에두르지 않고 낚아채듯 본질로 육박해 들어간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 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라고 말이다. ‘조’가 어떤 인물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연성 없는 성공담에 열광하는 일면을 통해 그 욕망을 들추어내는 것이다. 또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하인숙에 대한 설명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그 감정의 파장은 상당히 거세다. 음악대학을 나온 하인숙이 술자리에서 반강제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대한 인상은 어느 순간 ‘무진’의 본질로 이어진다. 하인숙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서 그가 듣는 것은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어떤 갠 날보다 높은 옥타브의 절규’다. 처절한 절규와 무자비한 청승, 하인숙의 ‘목포의 눈물’에서 급기야 서술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진의 그 냄새’를 맡기까지 한다. 희희낙락하며 술자리를 즐기는 듯 보였지만 무진스러움의 이면을 순식간에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는 무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얘기되는 인물이다. ‘뒤를 봐주는’ 여자와 결혼해서 제약회사의 전무 발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 살아남은 자의 내면은 생각보다 더 흉흉하고 복잡하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진에서 벗어났지만, 서울만큼이나 ‘무진’ 역시 그의 일부다. 이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무진기행’이다. 그렇게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으로 무참히 외면해 버린 어떤 진실, 혹은 과거에 대한 부채감의 기록. 분명한 것은 이 젊은이의 육성이 부끄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무진기행’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무진’을 골방에 가둔 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1964년 ‘무진기행’의 부끄러움은 좀 더 오랫동안 기억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모질게 버려둔 저마다의 ‘무진’이 있지 않은가.
박숙자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