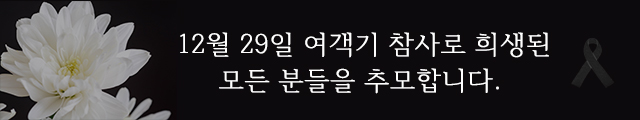설적 명의라는 중국의 화타와 한국의 허준은 사람의 걸음걸이나 말소리, 얼굴의 혈색과 인상만 봐도 병을 짐작하고 예방책을 가르쳐 줘 죽음을 면하게 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첨단 방사선 영상 사진이나 혈액·소변 화학검사법이 나오지 않은 옛날에는 직감이 중요했을 것이다. 물론 전래돼 오는 의서를 통해 이런 노하우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기초였을 뿐이고 역시 직관력이 좋고 많은 환자를 경험해 본 의사들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명성도 얻었을 것이다. 또 특이한 처방이나 처치법이 비방으로 전해져 왔다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으니 계승적 발전이 어렵고 더러 불의의 사고로 맥이 끊긴 것도 상당수였을 법하다.건강 분야를 오래 취재해 온 필자는 가끔 이 질환 분야에선 누가 명의냐고 물어올 때 대개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해당 의학회에서 이름난 간판 교수를 소개해 준다. 또는 ‘누구에게 수술 환자가 몰린다더라’, ‘누구의 수술 솜씨가 기가 막힌다더라’, ‘누가 내시경으로 족집게처럼 내과 질환을 판명하더라’는 구전을 바탕으로 명의를 안내해 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확신 없이 일러줄 때도 많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개되고 의학자 간의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것은 버려지고 합당한 것만 선택하는 현대의학의 시스템상 웬만한 의대 교수라면 비등한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래서 명의를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 어느 의대를 나왔든 다양한 환자를 많이 치료한 경험이 있으면 실력이 늘어 명의가 될 수 있다. 명의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게 명의의 핵심이다. 물론 타고난 의학적 감각에 따라 치료 능력이 좌우될 수 있지만 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예컨대 대학병원 교수들은 명의가 되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명의가 되는 또 하나의 부수적 조건은 열심히 새로운 이론과 테크닉을 배우고 이를 위해 해외 학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유력 제약 업체나 의료기기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대단위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문적 실력 차이가 치료 효과에도 그대로 비례 관계를 이루느냐, 명의로부터 치료받는 환자가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첨단의학이 발전하면서 문진이나 촉진의 비중이 줄어들고 데이터에 치중해 진단 치료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고작해야 1주일에 한두 번 의대 교수를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비인간적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와 연구 부담에 따른 바쁜 일정과 피로감으로 환자를 친절하게 대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맞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다가온 죽음과 지속되는 고통 속에 떠는 환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1990년대 이전만 해도 ‘간에 김 아무개’, ‘척추질환에 석 아무개’, ‘위암에 김 아무개’ 등 국가적 브랜드 네임을 갖는 의대 교수가 있었다. 이들은 일찍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첨단 의술을 배우고 귀국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유명 의대에 속하지 않은 교수들도 해외연수를 나가게 됐고 실력이 점차 평준화되면서 명의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최신 기본 지식은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 몇 년 전만 해도 언론에서 명의 시리즈를 실었지만 이런 시리즈를 거의 게재하지 않는다. 과학성을 추구하는 현대의학의 특성상 허준과 같은 신비감을 주는 명의는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풍부한 임상 경험에 열정과 양심까지 갖췄다면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다.정종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