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머니 = 배현정 기자] 편지는 내면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직역본이다. 가장 깊숙한 곳의 속살을 보여주는 내시경을 통해 사람과 예술, 역사를 잇는다.
문화재청은 지난 11월 <정조 어찰첩(正祖 御札牒)>을 보물 제1923호로 지정했다. 정조가 1796~1800년까지 4년간 좌의정 등 고위직을 역임한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300통이다. 이 편지들은 당시의 정사(政事)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사료다.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정조와 현대인들을 이어준다.
즉물적이고 광속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에 편지를 띄운다는 것은 낡은 관습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편지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그들의 삶과 희로애락, 역사가 깃들어 있다.
공감과 치유, 아날로그적 감성의 ‘꽃’
거리에서 우체통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우체통 수는 1만4920개다. 우체통은 3개월간 이용되지 않을 경우 철거 대상이다. 우편물은 2010년 6579만 통에서 2015년 2851만 통으로 5년 새 절반이 넘게 줄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우체통도 배고픔에 허덕인다. 한 우체통의 하루벌이는 평균 7.6통 수준이다.
그러나 우체통으로 전해지는 편지가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 편지의 효용성이 퇴색된 것은 아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능변이라도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30%밖에 나타내지 못하지만, 편지로는 깊은 마음이나 감정을 80% 이상 전달할 수 있다”는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말처럼, 편지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훌륭한 가교다.
결혼 정보 회사 듀오가 최근 실시한 ‘SNS 시대, 손편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손편지가 연애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은 손편지에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손으로 쓴 편지나 카드 등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라는 질문에 여성 10명 중 8명(80.2%)는 ‘정성이 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답했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인간관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카톡이나 SNS 같은 디지털뿐 아니라 직접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편지는 상처받고 단절된 현대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속 나미야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한다. 동네 꼬마들의 낙서에 답변한 것을 시작으로 나미야 할아버지는 고민상담사 역할을 하게 된다. 별명을 사용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민상담 편지를 써서 잡화점의 우유통에 넣으면, 할아버지가 다시 우유통에 답장을 놓아두는 식으로 솔직한 고민을 나눈다.
현실에서도 이처럼 손편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고민상담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문을 연 ‘나미야 공감우체통’의 운영자인 김진숙 씨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고민이나 대인관계의 갈등을 호소하는 비밀편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답을 찾기보다 ‘내 마음이 이래요’라고 토로하면서 상처를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사연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편지는 ‘문학치료(bibliotherapy)’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글로 표현해내는 ‘글쓰기’는 치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신과전문의인 이시형 박사는 ‘나에게 쓰는 편지, 치유의 시작’이라는 힐리언스 선마을 건강 칼럼을 통해 “나에게 쓰는 편지는 단순한 낭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글 쓰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내 속에 깊이 멍울져 있던 가슴 속 응어리가 용해되기도 하고, 그때 그러한 행동을 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해봄으로써 그 간극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돼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생각 등에 집중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얘기다.
편지의 외연이 넓어지다
비록 손편지로 사연을 건네는 일은 줄어든다 해도 인터넷의 등장으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SNS 등의 방식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소중하게 생각해 손편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절충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나무 조각에 사연을 적었듯 마음을 전하는 편지라는 소통 수단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가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성신 문화평론가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소통되면서 이해가 빠른 구어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데, 그 언어가 바로 서간체라 볼 수 있다”며 “자기계발의 방식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지식인들은 일부러라도 어려운 말을 쓰면서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했지만, 서간체 시대의 화법은 바뀌어야 한다. 가령 메신저를 보라. 정확한 문법과 형식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변화한 시대에는 감성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리더는 꼰대가 되기 쉽다.”
위인들이 남긴 편지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교과서다. <편지로 읽는 슬픔과 기쁨>의 저자 강인숙 씨는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편지는 수신인이 혼자서만 읽는 호사스런 문학이다. 그것은 혼자서 듣는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같다.” 그 말처럼 인류 예술과 역사를 바꾼 이들이 남긴 편지를 수신인이 된 기분으로 받아보며, 진귀한 호사를 누려보면 어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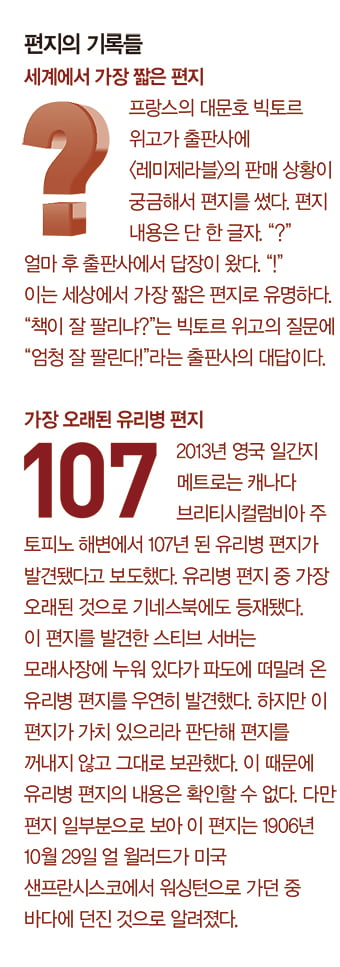

[big story] 편지의 인문학
- 편지, 사람과 시대를 잇다
- 작가의 편지를 보면 그림이 보인다!
- 사랑과 죽음 사이, 음악가의 편지
- 내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쓰다
- 편지의 저편에는 늘 나를 향한 누군가가 있다
- 나는 편지 쓴다, 고로 존재한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