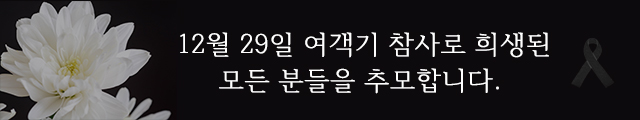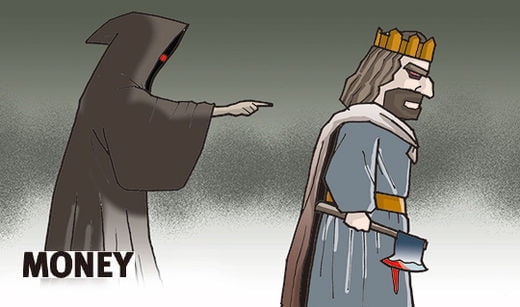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맥베스와 뱅코 장군의 반응은 다르다. 뱅코 장군은 유령의 존재를 반신반의하며 건성으로 듣는 데 반해, 맥베스는 속내를 들킨 것처럼 두려워한다. 그 말은 품을 수 없는 말이었고, 역모였고 반역이 아닌가. 그런데 맥베스는 유령의 말을 붙잡고 싶었다. ‘내 온몸을 거세게 뒤흔드는’ 말일 정도로 그 말에 사로잡히고 싶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모든 게 유령 때문일지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맥베스가 유령의 말을 붙잡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 힘이 있다고 느꼈고, 그 어떤 도덕적 판단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에겐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버젓이 살아 있는 덩컨 왕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왕좌에 오르고 싶은 소망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맥베스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동조하며 ‘잔인한 내 목표’로 내면화했다. 부화뇌동한 것이 아니라 맥베스의 말에 기대 자기 욕망을 만들어냈다.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뤄내고 싶었다. 그래서 ‘최악의 잔인성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서 욕망을 증폭시켜낸다. 맥베스에게는 안색을 바꾸지 말고 아무 일이 없는 듯 밝게만 보이라고 당부하고 덩컨 왕에게 나아가서는 “저희들은 폐하를 위해 기도하옵니다”라고 간언을 올리기 바빴다. 한때 맥베스가 주저하자 “용맹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요?”, “‘하고 싶어’ 그 말에 ‘감히 못해’로 대꾸하는 것은 비겁자예요”라며 ‘반역’을 ‘용맹’인 양 해석하기까지 한다.
맥베스와 그의 부인이 이렇게 자기 목표를 만들어 가는 동안 씩씩함, 남자다움, 희망 등의 말은 자주 호출됐다. 온갖 미사여구와 아름다운 말들로 사실을 가리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동안 역모와 반역의 행동은 희망을 위한 대단한 모험처럼 둔갑됐다. 어떤 희망인지, 누구를 위한 희망인지 하는 내용은 퇴색됐다. 오직 희망이라는 말만 남기고 희망을 위한 행동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 속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을 현혹하고 잘못된 것은 가면으로 가립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결국, 맥베스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유령의 말뿐이었다. ‘왕이 된다’는 말. 그 말은 맥베스의 내면 안에서 반복되고 강화되며 모든 행동을 합리화했다. 말이 말을 낳고, 말이 진실을 가렸으며, 말이 역모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맥베스는 거짓말과 환상 속에 갇혀 버렸다. 아니 자기 자신 안에 갇혀 버렸다.
진실을 가린 자, 허상에 갇히다
맥베스는 이처럼 유령의 허황한 말을 믿었다. 그래서 욕망이 야망으로, 야망이 역모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되지 않았다. 맥베스의 양심은 욕망보다 강하지 않았고, 이 야망을 조절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가 얘기를 건넨 사람은 공모자인 아내뿐이었다. 왕이 된 맥베스에게 타인은 눈엣가시였다. 가리고 둘러대도 소문이 퍼졌다.
그럴수록 맥베스는 두려워졌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 일은 연출과 연기였다. 이를테면 충성스러운 장군 뱅코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해를 명령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죽음을 비통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뱅코 장군을 살해하는 것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연기가 동시에 필요했다.
뻔뻔하게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을 쌓기 위해 그는 살해를 명령하는 자신과 슬퍼하는 자신을 분리시킨다. 그렇게 맥베스가 왕이 된 다음 왕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왕위를 지키는 일뿐이었다.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유령의 말을 강력한 것으로 만들고, 남들의 시선 앞에서 가면을 쓴 채로 연기를 했다.
그럴수록 맥베스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 사실과 환상의 경계를 헷갈려하며 점점 더 무너져 갔다. 맥베스에게 ‘헛것’이나 유령은 언제나 마음의 표현이었다. 욕심내는 것, 두려운 것, 감추고 싶은 것이 유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맥베스의 부인은 “누가 알든지 두려울 게 뭐예요”라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자기 속에 갇혀 헛것을 본 채로 죽어간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영화 <맥베스>에서 맥베스가 본 유령이 어쩌면 유령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어쩌면 유령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 사람 정도의 일반인이었을지도 몰랐고, ‘왕이 된다’는 말은 신빙성 없는 허튼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 그렇지만 맥베스에게는 확실한 말이 필요했고, 왕위를 보증하는 계시가 급했다.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현실로 만들면서 “난 운명의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다. 보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 암시에 가장 긴요한 말이기도 했다.
1606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맥베스>는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각색됐다. 그중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에서는 맥베스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령의 말이 아니라 ‘모두’로 지칭된 이들의 합창이 숭엄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노래의 제목은 ‘조국은 그동안 배반당했다(La patria tradita)’이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맥베스의 하강의 길, 그의 명은 다해간다. 그가 섬긴 유령은 허약한 자신을 위한 방패이자 알리바이일 뿐이었다. 맥베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다. 맥베스는 유령의 말이 아니라 만세 부르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다. 이렇게 맥베스가 죽고 비극은 끝났지만 맥베스가 영원히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안다.
글 박숙자 경기대 교양학부 조교수
일러스트 김호식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