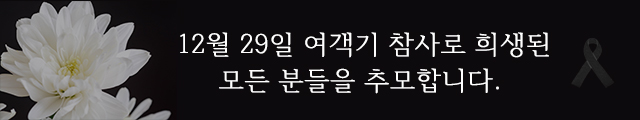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미국인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자전적 소설인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거침없는 언어와 사회성 짙은 소재로 1951년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20세기 최고의 미국 현대소설로 칭송받고 있는 이 소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다’라고 쓰여 있었으나, 이 열여섯 살 소년은 “펜시에서 퇴학이라는 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펜시가 너무나도 좋은 학교여서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고쳐 말한다. 이 소년의 이름은 홀든 콜필드다. 홀든은 펜시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그 후 2박 3일 동안 방황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바로 이 홀든의 48시간을 그린 소설이다.
사실 홀든의 방황은 펜시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홀든은 벌써 네 군데 학교를 전전했다. 그렇다고 홀든이 딱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고, 펜시의 경우처럼 과락으로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홀든은 펜시에서만 다섯 과목 중 네 과목에서 낙제했다. 유일하게 통과한 과목은 작문뿐이다. 심지어 한 선생님은 그를 작문의 천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네 과목이나 낙제했고, 결국 퇴학 통보를 받았다. 홀든은 늘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훌쩍 떠났지만, 이번에는 왠지 먹먹했다. 그래서 과락 점수를 준 역사 선생님께 들러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맘먹는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자마자 찾아뵌 것을 후회했다.
선생님은 홀든 앞에서 시험지를 꺼낸 뒤 홀든이 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다. 그리곤 “낙제시킨 데 대해서 불만 있나”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선생님이 홀든의 시험지를 보고 있을 때 홀든도 선생님을 지켜보았다. 단언컨대, 선생님의 모습은 자신이 받았던 점수보다 더 낫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게 선생이고 어른이 할 일인가. 당신이 정당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홀든은 묻고 싶었다. 결국 그는 무작정 학교를 나와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기차를 타서, 뉴욕의 거리를 거닐어보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허튼 수작을 걸어보기도 했다. 마음이 조각난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고 두려웠다. 적어도 여동생 피비하고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몰랐다. 홀든은 피비를 보기 위해 집으로 갔다. 단, 몰래 찾아가야 했다. 부모님을 볼 수는 없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피비는 마냥 오빠가 반갑기만 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보다 일찍 들어온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어리지만 홀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짐작했다. 따라서 피비는 더 무섭고 두려웠다. 다른 말을 해야 하는데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그래도 간신히 오빠에게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피비는 아빠 같은 변호사는 어떤지 물었다. 홀든은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되고 싶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그저 홀든은 이렇게 피비랑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일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하고야 말았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 바보 같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거야.”
피비는 홀든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알아들은 척하는 건지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라는 말을 또 불쑥 하고야 말았다. 오빠가 말한 ‘바보 같다’는 말은 어쩌면 아빠의 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홀든은 멀리 서부 쪽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피비는 자기 용돈을 챙겨주었다. 홀든은 피비의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 한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비의 돈을 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피비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피비는 오빠와 같이 떠나겠다고 떼를 썼다. 혼자 가겠다는 오빠와 그 오빠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고 말리는 피비, 그 과정에서 홀든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비는 오빠가 정말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을 반쯤은 알아들은 것일지도 몰랐다. 피비는 오빠의 바람 속에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봤다. 홀든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지켜주는 일,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했던 말, 피비가 그 말 속에서 본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빠였다. 그래서 오빠의 파수꾼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홀든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난다. 홀든은 쓰러졌고, 정신병원에 실려 갔다. 왜 정신병원인지 묻는 것은 난센스다. 1950년대 학교에서 내쫓긴 열여섯 살 소년이 갈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홀든은 정신병원에서 자신이 어떻게 학교에서 나와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쓴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결말에서 홀든은 “누구에게든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라고 말한다.
아마 어린 피비라면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말을 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라고 말이다. 하지만 선생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는 오직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인지”라는 물음만 반복적으로 묻는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였다. 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적 풍요 속에서 드러난 기성세대의 속물성은 열여섯 살 소년에게 이렇게 보인다.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면 그곳은 아이들에게 벼랑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은 어쩌면 간단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이야기를 ‘건전한 정신’ 운운하는 이야기로 막지 않는 것,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일로 시작될 것이다. 어린 피비가 그러했던 것처럼.
박숙자 경기대 교양학부 조교수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