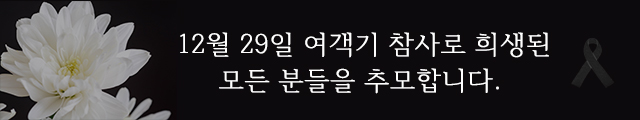신한은행 PB 강남센터 안원걸 팀장
안원걸 신한은행 PB 강남센터 팀장은 프라이빗 뱅커(PB) 생활을 시작하기 전 본사에서 상품 연구를 담당했다. 상품을 보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적성에 맞아 PB를 시작했다는 안 팀장. 그가 만난 고액자산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부자는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102855.1.jpg)
안 팀장이 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동물적 감각’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어렴풋하게 느낀다. 반면 부자들은 막연해 보이는 기회를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키는 과감함이 있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물론 A 씨도 올인성 투자가 아니라 자산배분 차원에서 실시한 투자였다”면서도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진짜 ‘큰손’들은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이처럼 때가 왔을 때를 대비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예비자금을 마련해둔다. 보통 입출금 통장에 2억~3억 원, 그 이상의 경우 1~3개월 단기 정기예금과 같은 형태로 준비한다. 이런 단기상품까지 합하면 예비자금은 총 자산의 10~20% 정도다.
헤지펀드, ‘정보’원하는 부자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곳, 그리고 정보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도다.
부자들은 해외 투자보다 국내, 먼 나라보다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투자를 선호한다. 정보력과 기동력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사회·경제 이슈를 먼 나라보다는 비교적 빨리 알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발 빠르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환매하는 데 10일씩 걸리는 먼 나라의 주식보다는 가까운 나라의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안 팀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헤지펀드가 부자들의 특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는 특징상 투자자도 많은 정보를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의 투자를 원하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원할 정도로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헤지펀드는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2세 부자 등 젊은 고액자산가들이 늘면서 부자들의 정보력 강화는 더욱 빨라지는 추세라는 것이 안 팀장의 설명이다.
“젊은 고객들은 정보도 많고,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어서 블룸버그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상품을 저보다 많이 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은 고객에게 미국 국채 관련 상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금을 맡기지 않고 직접 미국 선물시장에 들어가 거래를 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비중은 공격 자산 20%, 중위험·중수익 상품 40%, 나머지는 확정형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더러 젊은 부자층 위주로 공격 자산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는 않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부자들에게도 안전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추세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자들의 남다른 ‘촉’과 ‘과감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안 팀장은 “때로는 PB가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좀 더 확인 절차를 거치고, 외국인 매수·매도에도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꼭지나 발바닥은 못 잡더라도 모가지나 발목을 잡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목표수익률’의 개념이 강화됐고, 최근 고액자산가들은 목표수익률도 6~7% 정도로 하향 조정됐다고 한다.
부동산은 이제 금융 상품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힘들어 예전만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자산 포트폴리오상에 일정 비율은 갖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심리가 고액자산가 사이에서는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많지 않아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남아 있다.
고액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꼭’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연금저축이다. 이들에게는 ‘노후 준비’ 차원이라기보다는 연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이유가 크다.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보이겠지만, 이들은 절대 허투루 돈이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1000원 정도의 은행 수수료에도 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안 팀장이 말하는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돈의 가치를 크기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절대 상황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테면 ‘쌈짓돈’이나 ‘공돈’ 같은 것들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어디서 ‘공돈’이 생겼다고 하면 그날 술값으로 쓴다거나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 길에서 주운 돈 1000원이나, 주식으로 번 1000원이나, 1시간 땀 흘려 번 돈 1000원이 다 같은 거예요. 쉽게 생긴 돈이라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죠. 한 번은 제가 ‘쌈짓돈’이니 ‘공돈’이니 하는 말을 꺼냈다가 고객에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이런 철학이 뚜렷합니다.”
함승민 기자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