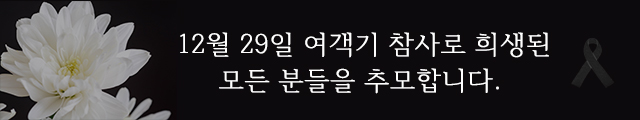사진작가 황규태 & 문화평론가 조우석
사진작가 황규태가 5년 만에 서울 삼청동에서 개인전 ‘인생은 즐거워’를 선보였다. 초현실, 문명과 미래 등 도전적인 주제를 다뤄온 원로 사진작가가 이번에는 신세대 감각을 더한 패러디를 활용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개인전을 마치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의 작업실에 문화평론가 조우석이 방문했다.

그런데 뒤늦게 혐의가 인정돼 2006년 6월부터 미국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했다. 그가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신정아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러 올 초 아이로봇전에서 그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도전적이었고 시대의 화두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그는 5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인생은 즐거워’에서 황 작가는 노장의 내공에 신세대적 감각을 더해 다양한 패러디를 선보였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우리에게 익숙한 르네상스 화가들의 고전뿐만 아니라 앤디 워홀의 팝아트, 데미안 허스트의 현대미술, 만 레이의 사진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다.

문화부 기자와 작가로 첫 만남
황 작가를 만난 것은 개인전이 끝난 4월의 끝자락이었다. 황 작가의 작업실을 겸한 집은 평창동에서도 높은 곳에 있었다. 3층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우편함이 보였다. 지하 1층 우편함 옆에 낙서처럼 ‘건달 황규태’라는 글귀가 보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평론가 조우석이 갈겨 쓴 ‘낙서’였다. 몇 점의 작품이 걸린 거실은 꽤 넓었는데, 황 작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휑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에는 먼저 도착한 조우석 씨가 황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리에 앉으며 신정아 씨의 자서전 <4001>을 도마에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전까지 두 사람은 신정아 씨와 ‘삼총사’라 불릴 정도로 자주 어울렸다. 조심스럽게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 작가는 “나는 그 책 읽어보지도 않았어요”라며 말문을 닫았다. 베테랑 기자답게 조 씨가 나서 어색한 자리를 수습하며 “우린 동업자”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우석(이하 조) : 우린 평론가와 작가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예요. 제가 신문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얼마 전에 그만뒀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신문사 문화부에 있을 때 만났죠. 실은 그때 제가 선생님의 열혈팬이었습니다.
황규태(이하 황) : 조 선생이 문화일보에 계실 때 뵙지 않았나요. 벌써 15년이 더 됐네요.
조 : 전시회에서 선생님 작품을 보고 제가 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돈을 봉투에 넣어가서는 작품을 달랬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반을 떼서 다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황 : 그때 무슨 작품을 샀죠. 아마 <씨>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린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해드릴께요.
조 : 저야 좋죠.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사실 문화부에 있으면서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많은 작품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사진이 미술 시장의 마이너가 아니고 현대미술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 작품을 최고로 꼽습니다. 이번 전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도 좋았고 작품도 많이 팔렸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선생님이 시도하신 사진이 일반인에게도 먹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 : 조 선생같이 잘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조 : 그게 언제였죠.
황 : 1995년쯤일 겁니다. 제가 원래 신문사 사진기자를 했어요. 경향신문 사진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요. 햇수로 3년쯤 하다 그만뒀어요.
조 : 당시 선생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신문 사진이니까 대부분 다큐멘터리 사진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 나름의 서정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시받아서 찍는 게 답답했을 겁니다.
황 : 그때도 신문사 일 하면서 내 사진을 따로 찍긴 했는데, 사진기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그게 답답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카메라 메고 나갔으니까 할 맛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만뒀죠.
조 : 그 시절이 아쉽지는 않으세요.
황 : 지나고 보니까 아쉽더군요. 미국에 가서도 사업하는 틈틈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 주관이 섰던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찍었어요. 그때 지금만큼의 의식과 주관이 있었다면 좋은 사진을 많이 했을 거 같아요. 1960년대 청계천이며 전차 등을 다 찍어놨을 텐데 말이죠. 당시 우리네 삶을 얼마나 잘 담을 수 있었겠어요.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고 넘어간 게 너무 아쉬워요.
![[Friends] “놀이는 내 작품의 처음이자 마지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105364.1.jpg)
조 : 미국은 어쩌다가 가시게 된 건가요.
황 : 이민 가는 친구 수속 도와주러 갔다가 저도 그냥 가게 됐어요. 그게 1965년이에요. 그 길로 한 30년을 미국에서 살았네요.
조 : 미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셨잖아요. 사업하면서 사진을 접으신 건가요.
황 : 장사한답시고 본격적으로 사진을 못했죠.
조 : 미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게 된 겁니까.
황 :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에는 사진현상소를 했어요. 그러다 미주동아일보를 하고, 유대인 친구들과 은행도 했어요. 그때 창립 멤버가 한국인과 유대인이 반반이었어요. 사람들이 은행을 했다고 하면 대단한 걸로 아는데, 미국에서 은행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몇백만 달러로도 은행을 열 수 있거든요. 은행 이름이 월셔 스테이트 뱅크라고 지금은 미국 100대 은행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죠. 저는 나중에 지분을 정리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요.(웃음)
조 : 호텔도 하셨잖아요.
황 : 은행 전에 호텔을 경영했죠. 객실이 150개인 호텔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한인 비즈니스가 태동기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철없고 겁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조 : 비즈니스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황 :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진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사진밖에 없었어요.
조 : 그걸 전문용어로 팔자소관이라고 합니다.(웃음)
황 : 비즈니스에 미련은 없지만 후회는 남아요.
전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황규태식 놀이정신
![[Friends] “놀이는 내 작품의 처음이자 마지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105365.1.jpg)
선생님은 진부하던 사진에 컬러를 도입하고 포스트모던한 작업을 처음 시도한 분이세요. 유명 사진작가가 된 김아타가 제 친구인데, 지금의 김아타가 있기까지 황 선생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황 : 김아타 씨가 뜨기 전 제가 후원자 역할을 했죠.
조 : 김아타가 포스트모던한 작업을 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에게 모범이자 롤모델이 황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진사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번 전시는 그 위력을 확인시켜준 전시였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일흔이 넘었지만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현역 원로작가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황 : 좋으니까 하는 거죠. 미국서 사업을 한꺼번에 접고 나니까 돌아갈 데가 사진밖에 없었어요. 비즈니스는 제가 똑똑해서라기보다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오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항상 좋았어요.
조 : 생각이 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선생님은 20, 30대와도 소통이 가능한 의식의 소유자이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선생님 작품의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놀이정신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에는 원로작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엄숙주의가 없어요. 실생활에서는 사기라는 것이 예술에서는 실험이고 놀이거든요. 그 뿌리는 60, 70년대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이었던 플럭서스(fluxus)에 닿아있다고 보는 거죠.
황 : 그 사람들도 실상은 놀이였어요. 저로서는 작업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거지, 결과 자체가 놀이일 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보다 재미있는 놀이가 없어요.
조 : 플럭서스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걸 대중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선생님 작품의 매력이 반밖에 안 알려진 거 같습니다.
의외성과 실수는 창작의 또 다른 모태
황 : 저는 지금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작업을 할 때 의도는 갖지만 과정의 의외성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좋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제 경우에는 실수가 창작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픽셀을 늘리다 깨졌는데 그게 작품으로 재탄생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런 작품을 하죠.
조 :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정아 씨 이야기를 하는데, 전시랑 신정아 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황 : 사실 우리가 만나서 오늘처럼 진지한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매일 농담이나 하면서 놀아요.(웃음) ‘밥 먹자’는 소리가 둘이서 하는 가장 진지한 이야기일 겁니다.
조: 나이 차이는 제법 있지만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지냅니다. 친구는 나이와 상관이 없잖아요. 조영남 형하고 다 친구죠. 예술이란 무엇입네 하는 소리는 덜떨어진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황 : 진지한 얘기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성격상 재미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공연이나 모임도 재미없을 거 같으면 안가요. 나이를 먹으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재미있을지 없을지가 보여요. 작품도 그렇게 해야죠.
글 신규섭·사진 이승재 기자 waw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