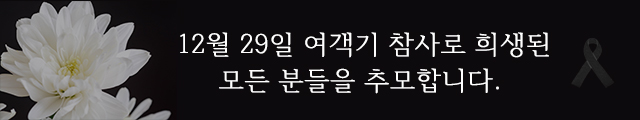느새 청첩장의 계절, 가을이 코앞이다. ‘혼(婚)테크’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요즘, ‘결혼 잘하기’ ‘시집, 장가 잘 보내기’의 중요 항목에서 배우자, 혹은 배우자 집안의 경제력이 갈수록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는 듯하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와인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유럽, 특히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혼수와 관련된 유명한 역사적 일화가 있다.대표적으로는 아키텐 공국의 공주가 영국 앙리 2세와 결혼하며 지참금으로 가져간 보르도 때문에 발생한 백년전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사 속 결혼 지참금은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당시 봉건제도 관습에 따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보르도 2등급이면서도 1등급과 맞먹는 우수한 와인들을 지칭하는 슈퍼 세컨드(Super second)의 대표적인 샤토 피숑 롱그빌 콩테스 드 랄랑드는 신부들의 결혼 지참금과 처가의 유산 상속으로 이어지는 수혜를 입은 전형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 와인 이름은 무척 길다. 그런데 이렇게 긴 이름이 사실 와인과는 별 상관없이 장가 잘 간 행운을 거머쥔 두 집안의 이름 나열이라는 걸 알면 살짝 맥이 빠진다. 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17세기에 포이약과 마르고 마을에 포도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와인 판매도 병행했던 로잔(Pierre de Mazure de Rauzan) 씨는 그의 딸을 보르도 의회의 첫 의장이었던 자크 드 피숑-롱그빌(Jacques de Pichon-Longueville)과 결혼시키며 지참금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주었다.1850년, 자크의 손자(로잔 씨에게는 외증손자)인 조셉 피숑-롱그빌 남작이 죽으면서 두 아들들에게는 포도밭의 5분의 2와 일체의 장비를, 딸들에게는 5분의 3 정도의 포도밭을 상속하게 된다. 다섯 명의 자녀에게 공히 땅을 주었지만 자손이 없었던 세 자녀가 자신들의 소유권을 라울과 비르지니에게 넘기면서 샤토 피숑 롱그빌이 결국 2개로 분할되기에 이른다.남자 형제인 라울이 샤토 피숑 롱그빌 바롱(Chateau Pichon-Longueville Baron)을, 앙리 드 랄랑드 백작에게 시집간 비르지니가 샤토 피숑-롱그빌 콩테스 드 랄랑드를 맡았다. 콩테스(Comtesse)는 프랑스어로 백작부인이란 뜻이니 이 샤토 이름을 직역하면 샤토 피숑-롱그빌 랄랑드 백작부인이 된다.1855년, 이 두 샤토는 모두 2등급의 샤토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지금은 비록 피숑-롱그빌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긴 했지만, ‘피숑 남매’란 애칭으로 전 세계 애호가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 긴 이름들은 각각 ‘피숑 랄랑드(혹은 피숑 콩테스)’와 ‘피숑 바롱’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장가 잘 간 덕에, 며느리 잘 얻은 덕에, 그 옛날 사돈 덕에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피숑-롱그빌, 그리고 랄랑드라는 가문의 이름을 남긴 이 사연은 현대 시대 열쇠 서너 개를 받은 남자들 얘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면 휴대전화 속에 저장해 둔 지인들의 리스트를 훑어보자. 장가 잘 갔다고 소문난 친구에게 “와인 한 잔 사라!”고 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장가 잘 갔어’라며 혼자 있어도 흐뭇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지인들을 불러 한번 제대로 파티를 열라. 국내 와인 매장에서 피숑 랄랑드는 빈티지에 따라 20만~30만 원이고, 같은 샤토에서 만든 이 와인의 세컨드 와인은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김혜주 와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