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대보증채무가 발견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법적 요건에 따라 상속 셈법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자.
[상속 Q&A]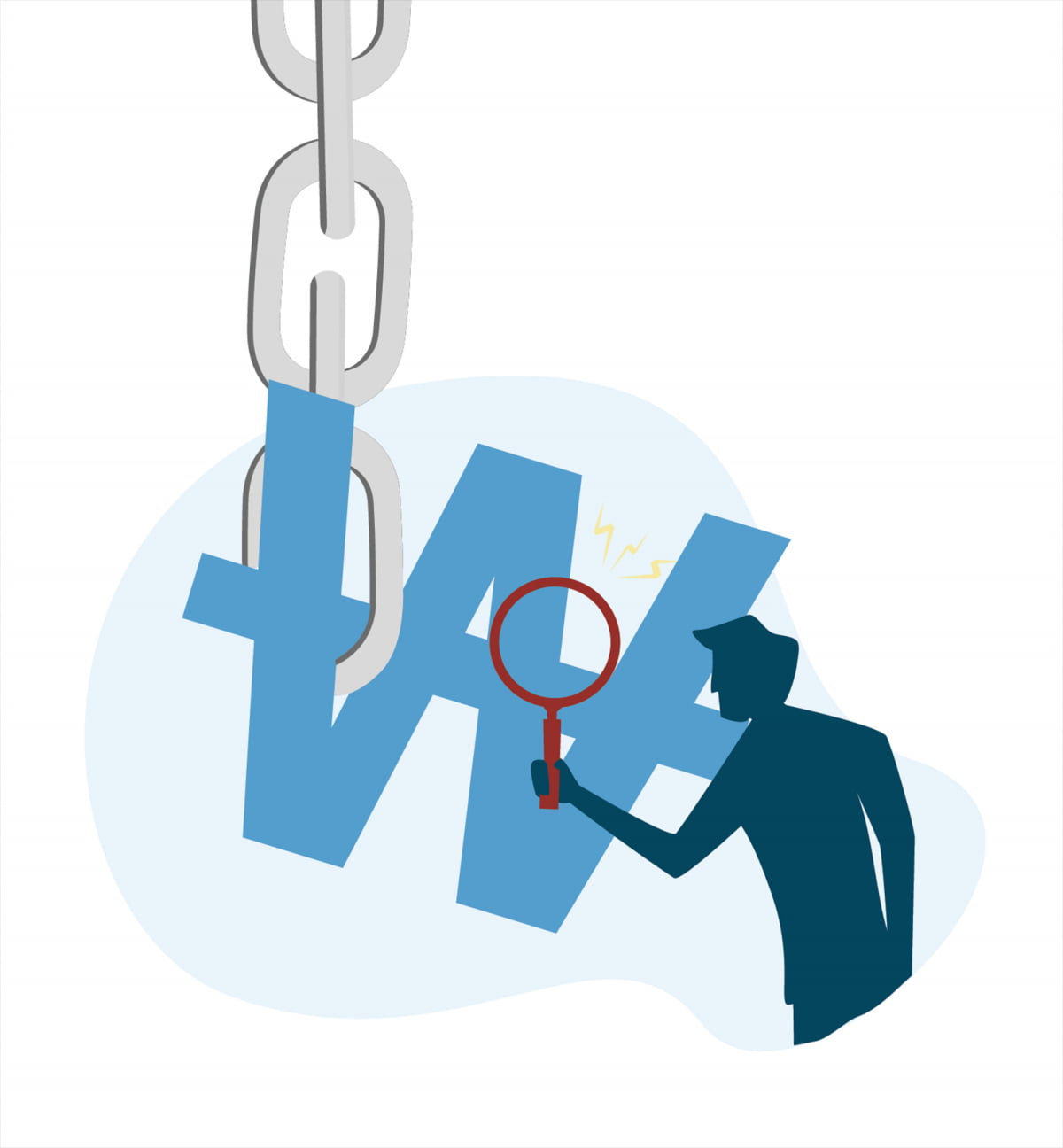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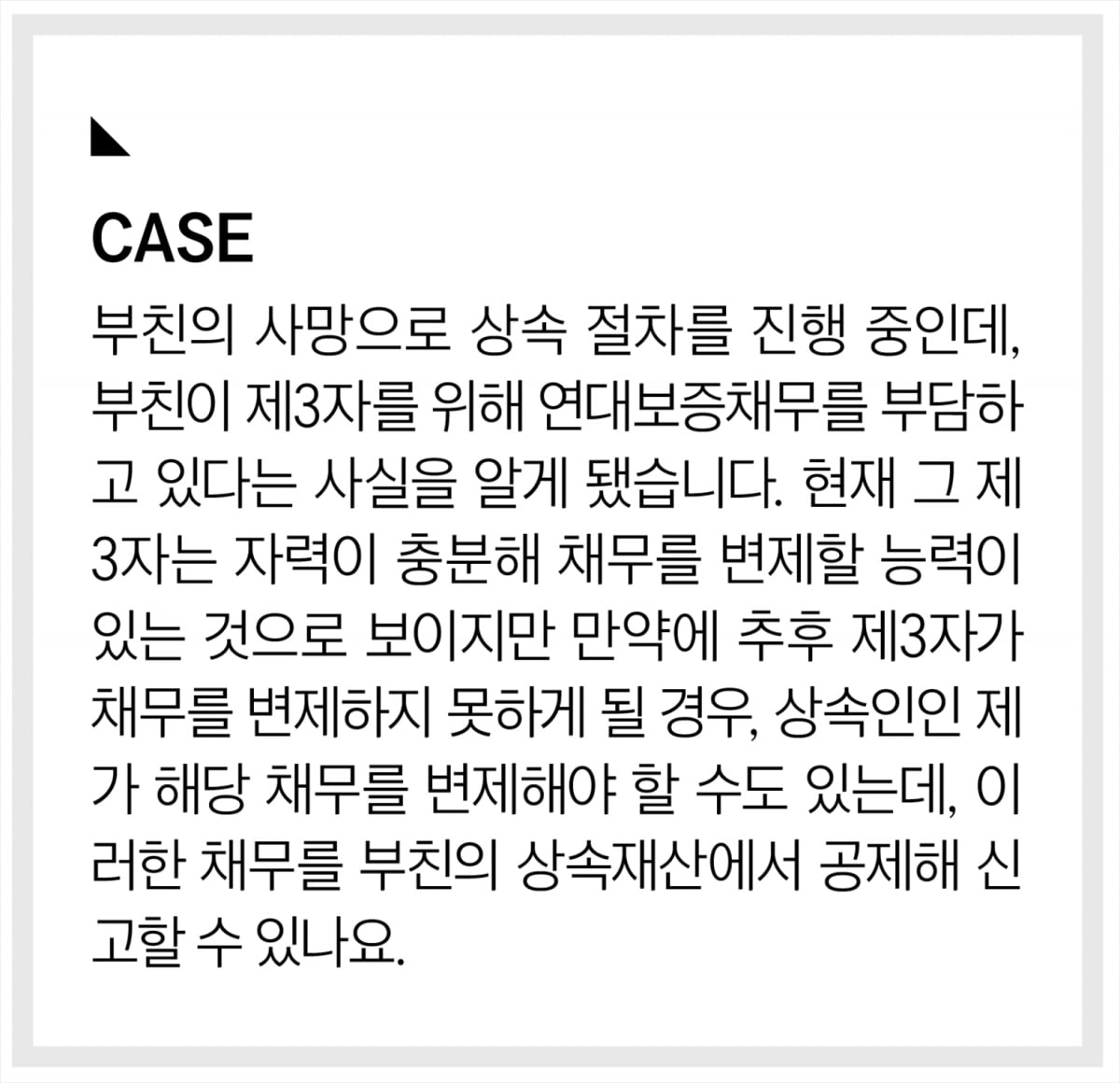
이때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주채무자의 파산, 화의, 회사 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사업 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돼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 이를 연대보증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가 모두 끝난 이후라도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되고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